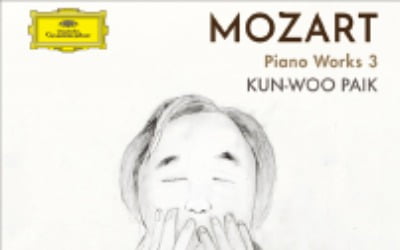詩, 비틀거리는 삶에 불빛을 뿌리다 … 임선기씨 12년만에 첫 시집 '호주머니 속의 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994년 작가세계 신인상을 받으며 문단에 나온 임선기씨(38)가 등단 12년 만에 첫 시집 '호주머니 속의 시'(문학과지성)를 펴냈다.
시에 드러나는 현실의 여러 모습은 가난하고 외롭고 우울하며 때로는 두려움마저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영혼과 예술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의 그림자를 환기시키면서도 시어는 투박하지 않다.
시인은 주위를 둘러싼 자연을 노래하면서 내적 자유와 절대 세계를 갈망한다.
그 매개체는 나무다.
'그 집에는 나무가 있어서/말없이 가난했네/나무가 있는 집은 가난한 집/나무는 서정,/그 나무,집과 숨쉬고 있네//그 나무에는 집이 있어서,/나는 집을 관이라 부르지/관 속에는 아무 말도/떠다니지 않네/말들은 나무 속에/나무는 또 고요 속에…'('나무가 있는 집' 중)
시인은 세계의 부정성을 더욱 선명하게 되비치는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확장하면서 자신이 좋아하고 영향받은 예술가들의 이름을 떠올린다.
소월과 릴케,엘뤼아르,말라르메,발레리 등의 시인과 파울 클레,달리,로댕 등이 그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비열한 현실을 예술을 통해 뛰어넘으려 했다는 것.
시인도 이들처럼 '비틀거리는 죽음'을 넘어 영원의 세계를 지향한다.
'파리의 한 골목/젊은 릴케가 비틀거리는 생을 본 곳/근처 육군병원에서 넘어오는 바람에/죽음이 섞여 있다/중략)/다다르기에/별은 너무도 멀다/시간을 공부하던 친구는 끝내/미치고 말았다/그의 주검을 '영원'이 거두어갔다…'('12월' 중)
시인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근원적인 것에서 너무 떨어져 살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재창 기자 charm@hankyung.com
시에 드러나는 현실의 여러 모습은 가난하고 외롭고 우울하며 때로는 두려움마저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영혼과 예술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의 그림자를 환기시키면서도 시어는 투박하지 않다.
시인은 주위를 둘러싼 자연을 노래하면서 내적 자유와 절대 세계를 갈망한다.
그 매개체는 나무다.
'그 집에는 나무가 있어서/말없이 가난했네/나무가 있는 집은 가난한 집/나무는 서정,/그 나무,집과 숨쉬고 있네//그 나무에는 집이 있어서,/나는 집을 관이라 부르지/관 속에는 아무 말도/떠다니지 않네/말들은 나무 속에/나무는 또 고요 속에…'('나무가 있는 집' 중)
시인은 세계의 부정성을 더욱 선명하게 되비치는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확장하면서 자신이 좋아하고 영향받은 예술가들의 이름을 떠올린다.
소월과 릴케,엘뤼아르,말라르메,발레리 등의 시인과 파울 클레,달리,로댕 등이 그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비열한 현실을 예술을 통해 뛰어넘으려 했다는 것.
시인도 이들처럼 '비틀거리는 죽음'을 넘어 영원의 세계를 지향한다.
'파리의 한 골목/젊은 릴케가 비틀거리는 생을 본 곳/근처 육군병원에서 넘어오는 바람에/죽음이 섞여 있다/중략)/다다르기에/별은 너무도 멀다/시간을 공부하던 친구는 끝내/미치고 말았다/그의 주검을 '영원'이 거두어갔다…'('12월' 중)
시인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근원적인 것에서 너무 떨어져 살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재창 기자 char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