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8:39
수정2006.04.02 18:42
금융감독원이 최근 "과도한 반대매매는 약관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증권업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동안의 반대매매 관행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점에서다.
"고객들이 과도한 반대매매를 이유로 증권사에 배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투자자 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지금까지 고객이 외상(미수)으로 주식을 산 뒤 이틀 후까지 이를 결제하지 않으면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동시호가 때 미수거래 종목뿐 아니라 고객 계좌에 들어 있는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하한가 매도(반대매매) 주문을 내왔다.
미수금 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관행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주장이다.
문제는 금감원의 '약관 위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당기간 이같은 관행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모든 증권사가 증권전산의 매매시스템을 이용해 동일한 방식으로 반대매매 주문을 내고 있다"며 "매매시스템이 변경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이런 관행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강변했다.
약관 위반이란 유권해석도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증권업계 다른 관계자는 "증권사가 약관을 위반했다기보다는 약관 내용이 애매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증권사 약관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반대매매를 하라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실제 금감원도 이런 맹점을 의식,"미수거래 후 사흘째 되는 날 일단 미수거래 주식만 반대매매한 뒤 그래도 결제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나흘째 되는 날 다른 종목을 추가 반대매매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투자자 보호는 금융감독의 일차적 목표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일에는 순서가 있게 마련이다.
금감원이 약관과 매매시스템도 바꾸지 않고 반대매매 관행을 '약관 위반'으로 모는 것은 증권맨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게 증권사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주용석 증권부 기자 hohoboy@hankyung.com
![[다산칼럼] 금융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27877087.3.jpg)
![[취재수첩] 美암학회에 초대받지 못한 韓 AI 신약 벤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955477.3.jpg)
![[차장 칼럼] 포기하기 전에 가볼만한 곳](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5272590.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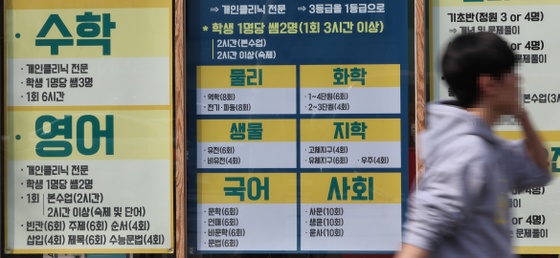

![옥수수 가격 반등…에탄올 수요가 견인 [원자재 포커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5973355.1.jpg)








![[책마을] "경제 위기도 약이 된다…70년대 석유파동은 좋은 위기"](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6326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