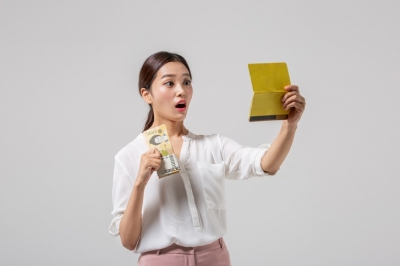[경제불씨 이렇게 살리자] (2) '투명성 덫'에 시장 죽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가계와 함께 소비의 한 축인 기업들이 정치적 시장적 기업적 요인 때문에 '투명성의 덫'에 걸려 있다"며 "때문에 기업에 의한 소비도 살아나기 힘든 상태"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기업 투명성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감시 △경영 투명성에 대한 기업 내부의 노력 등 여러 요인 때문에 돈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 경제가 빠진 '투명성 함정'의 한 단면을 지적한 것이다.
투명성 함정은 대부분 정부가 팠다.
개혁과 도덕성이란 명분에 매달려 경제 현실을 외면하고 남발한 제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표적인 게 기업 개혁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출자총액제한 제도 유지,접대비 실명제 도입 등이다.
불투명한 기업구조와 경영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들은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켰을 뿐 아니라 소비시장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특히 50만원이 넘는 접대비 지출은 기업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는 '접대비 실명제'는 유흥주점 등 서비스업의 매출에 직접적 타격을 입혔다.
재작년 '10·29부동산 안정대책' 이후 쏟아져 나온 각종 투기억제책도 마찬가지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를 종전보다 두배 이상 올려 놓은 주택거래신고제 도입,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60% 부과 등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거의 동결시켜 버렸다.
시장에선 "투기 잡으려다 시장을 잡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제도뿐 아니다.
청와대와 정부 내 고위 당국자들의 불필요한 '개혁 구호'도 경기엔 마이너스였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일부 과도한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만 보여도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등이 나서 '부동산 투기억제 의지'를 과시하는 강경 발언을 해 시장을 다시 얼어붙게 하기 일쑤였다.
이는 정부 내 불협화음에 따른 정책불안으로 비쳐 기업 국민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소위 '구호 함정'도 무시할 수 없는 경기불안 요인이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달초 금년 경제운용계획에서 "각종 사회정책 추진시에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명분에만 치우쳐 단행한 사회개혁 조치들에 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인 것이다.
김광두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경기 불씨를 살려나가려면 정치권과 정부가 '투명성 강박증'과 '개혁 구호'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통령이 '경제 올인'을 선언한 만큼 국민들에게 국정의 최우선이 경제회생이란 점을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는 심리'인 만큼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거스르는 말과 행동을 제발 조심해 달라는 주문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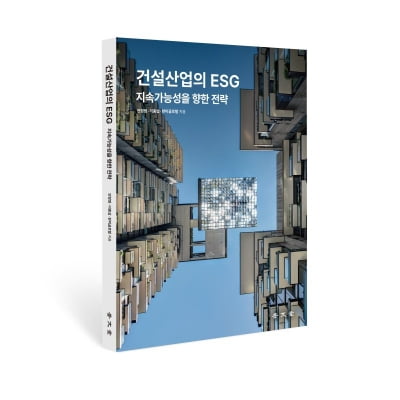
![레이싱 카트인 줄…미니 '팬층'에 제대로 어필한 전기차 [신차털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81598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