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7:13
수정2006.04.04 07:18
3년전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부인인 셰리 블레어가 45세의 나이로 넷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영국에서는 늦둥이 붐이 일었다.
"많이 낳자'는 열 마디의 구호가 무색한 상징적인 일이었다.
비단 영국뿐이 아니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의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문제여서 각국은 다투어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기에 바쁘다.
이제 출산장려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할 만큼 대륙적인 아젠다로 부상했다.
프랑스에서는 아이를 많이 가질수록 출산급여액이 늘고 입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임신 8개월이 되면 8백유로(1백10만원)의 출산장려금도 받는다.
독일은 아이가 6세가 될 때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아시아 국가 중에도 일본은 이미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는 여러 지원책을 마련했으며,싱가포르에서는 고학력 여성의 출산을 독려하면서 '3자녀 갖기 운동'을 펴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출산율(1.17)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저(低)출산율은 노동력 부족,인구 고령화,노년 인구의 부양비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급기야 국회의원들이 나서 출산가정에 대해 50만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하고,4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소식이다.
지난 8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증가는 국가경제를 위협한다 해서 아이를 많이 가지는 부모들은 수치심을 느낄 정도였다.
"하나씩만 나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란 표어는 그래도 점잖은 편이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거친 표어들이 거리 곳곳에 난무했다.
인구증가는 곧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인구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는 농촌지역의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육책으로 현금과 육아용품 등을 지급하면서 다소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긴 하다.
그러나 출산문제는 여성취업 교육 육아 등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여성만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닌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떠올라 있다.
"많이 낳아 애국하자"는 격세지감의 구호가 등장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박영배 논설위원 youngbae@hankyung.com
![[한경에세이] 행복하기 그리고 잊지 않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629524.3.jpg)
![[특파원 칼럼] 100년 후 연금까지 고민하는 일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564071.3.jpg)
![[홍영식 칼럼] 헌법 전문은 '장바구니'가 아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5703783.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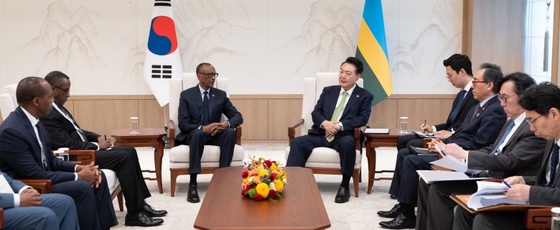


![[단독] 홈플러스,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한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2731.3.jpg)
![[오늘의 arte] 예술인 QUIZ : 가택 연금됐던 러시아의 '反푸틴' 감독](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036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