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0:25
수정2006.04.02 20:29
이병훈 < 남양알로에 사장 billee@univera.com >
한창 벤처바람이 불었을 때 서울 테헤란로의 음식점에는 'CEO'니 'OO닷컴'이니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게 유행이었다.
며칠 전 그중 한 음식점에 갔더니 사장이 음식점의 개명을 심각하게 고민중이라고 털어놓았다.
처음엔 벤처업계 종사자들의 모임장소로 애용돼 이름값을 하는가 싶더니 요즘들어 손님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정말 벤처는 우리에게 미운 오리이고 재앙일 뿐인가.
벤처의 어두운 면만 강조하다보면 자칫 밝은 면을 도외시하기 쉽다.
지금 벤처의 어두운 면만 보다보면 과거 벤처열풍이 불 때 벤처의 좋은 면만 보다 어두운 면을 놓친 것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 벤처의 긍정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고 벤처의 도약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벤처는 한마디로 꿈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 꿈을 실현하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80,90년대만 해도 회사를 차리려면 3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뛰어넘어야만 했다.
그 첫째가 자금의 벽이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인재가 모여 있어도 돈이 없으면 창업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벤처의 시대가 열리면서 엔젤투자자와 기관투자가들이 비전과 패기,모험정신에 거액을 내놓으며 자금의 벽이 무너진 것이다.
두번째로 벤처는 배경의 벽을 무너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벤처는 또한 나이와 성(性)의 벽을 허물었다.
만 26세의 나이로 미국 현지 법인의 대표이사 명함을 건넸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냉담하기 그지없었다.
"그 나이에 무슨"이라는 폄훼의 뜻이 담겨 있었다.
요즘은 아이디어가 좋고 열정이 있으면 누구나 사장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대학생 CEO,고등학생 CEO까지 생겨났다.
시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벤처의 특성을 십분 활용해 가사와 자신만의 독자적인 일을 병행하는 주부 CEO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벤처열풍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화교,유태인과 더불어 한국인이 새로운 창업의 귀재로 부각되고 있다.
어렵게 싹튼 벤처산업에 진드기가 몇 마리 생겼다고 뿌리째 뽑아버릴 것인가,햇빛과 영양제로 거목을 만들 것인가.
친구로 지내고 있는 한 창투사 사장도 얼마전 "부실한 벤처 때문에 돈만 날렸다.
벤처라면 지긋지긋하다"며 원망섞인 푸념을 늘어놓았다.
최고 신랑감으로 벤처회사 종사자가 뽑혔던 게 불과 한두해 전인데 요즘들어 벤처는 미운 오리 취급을 받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 큰 동력을 부여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집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자본금을 마련하면 그나마 능력있는 사람으로 평가됐다.
소장 CEO 모임에 가서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어느 지방 출신이냐"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
바쁜 시간을 틈내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숨가쁘게 돌아가는 업계의 정보와 최신 뉴스를 교환하느라 학연과 지연을 따질 겨를이 없다.
![[한경에세이] 행복하기 그리고 잊지 않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629524.3.jpg)
![[특파원 칼럼] 100년 후 연금까지 고민하는 일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564071.3.jpg)
![[홍영식 칼럼] 헌법 전문은 '장바구니'가 아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5703783.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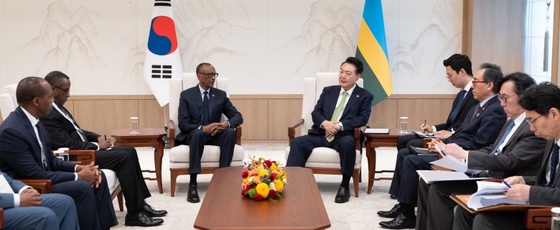


![[단독] 홈플러스,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한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2731.3.jpg)
![[오늘의 arte] 예술인 QUIZ : 가택 연금됐던 러시아의 '反푸틴' 감독](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036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