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협상전선] (29) 꼬여가는 하이닉스 <5>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3월 중순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의 스탠퍼드 호텔.
회의실에서 갑자기 큰 고함소리가 터져 나왔다.
"Get out! You, get out! I'm in charge(나가! 당신, 나가 버려! 내가 책임자야)."
이덕훈 한빛은행장이 만프레드 드로스트 외환은행 부행장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러댔다.
험한 꼴을 당한 드로스트 부행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흥분해 어쩔줄 몰라하는 드로스트를 동석했던 이연수 외환은행 부행장과 박종섭 하이닉스반도체 사장이 가라앉혔지만 어색한 분위기는 쉽게 수습되지 않았다.
협상 대표들은 각각 다른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고 그이후 협상의 주도권은 자연스레 마이크론으로 넘어갔다.
이 행장과 드로스트 부행장이 마이크론과의 협상테이블에 직접 앉은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어떻게하든 매각을 성사시키려는 정부에 의해 김경림 외환은행장이 전격 경질된 뒤 이 행장이 '대타' 협상대표로 미국으로 날아갔다.
드로스트 부행장도 매각에 소극적인 외환은행 대주주인 독일 코메르츠방크를 움직이기 위해 협상장에 동행시켰다.
그러나 이런 의도는 보기좋게 빗나갔다.
하이닉스를 맡은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협상대표로 전격 임명된 이 행장과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매각 방침에 떨떠름했던 드로스트 부행장의 동행은 오히려 협상전선에 파열음만 깊게 울리게 했다.
따지고 보면 마이크론과의 협상은 시종일관 '사공 많은 협상'이었다.
1백4개에 달하는 각양각색의 채권금융회사와 하이닉스는 물론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 등 정부인사까지 끼어들어 마이크론조차 누구를 상대로 협상을 진행해야 할지 난감해 했을 정도다.
작년 11월 정부와 채권단은 '하이닉스 구조조정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신국환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 마당에 구조조정특위를 만들자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비아냥이 들려왔다.
그러나 신 위원장과 구조조정특위의 수명은 길지 못했다.
신 위원장이 "하이닉스의 독자생존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그의 역할은 점점 축소돼 갔다.
그가 산자부 장관으로 복귀한 뒤 특위는 자연스럽게 개점 휴업 상태로 들어갔다.
신 위원장의 바통을 박 사장이 이어받았다.
그러나 박 사장은 '얼굴마담'에 불과했다.
박 사장이 적극적으로 마이크론과의 협상에 나섰지만 그에겐 협상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결정권이 없었다.
그가 애써 만들어온 협상안은 주요 채권은행들의 승인을 일일이 거쳐야 했다.
'협상 실세'는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었지만 김 행장과 이 부행장으로 짜여진 외환은행 협상팀의 태도는 정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 3월10일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던 김 행장을 전격 경질하고 협상대표를 한빛은행의 이 행장으로 갈아치운 건 이런 배경에서였다.
그러나 이 행장도 정부의 성에 차지 않았다.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마침내 정부가 실질적인 주역으로 전면에 등장했다.
지난 4월18일 채권단 운영위원회가 이 행장에게 협상전권을 주는 것을 사실상 거부하자 정부가 직접 나서 협상전권을 일임토록 했다.
'신국환 위원장→박종섭 사장→김경림 행장→이덕훈 행장→정부'로 협상대표가 끊임없이 교체된 셈이다.
이에 반해 마이크론은 작년 12월 초 하이닉스와 '전략적 제휴협상'을 시작한 이후부터 스티브 애플턴 사장을 전권을 가진 일관된 협상대표로 내세웠다.
사공 많은 한국측 협상팀과 '대표 사공'이 뚜렷했던 마이크론 협상팀.
사공 많은 협상팀이 내부 작전회의에 힘을 소진해야 했던 점을 감안하면 '협상 실패'는 어쩌면 정해진 수순이었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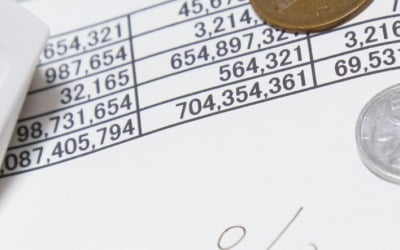
![새 '경제학원론' 내놓은 한은 총재와 진보 경제학자 [강진규의 BOK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71554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