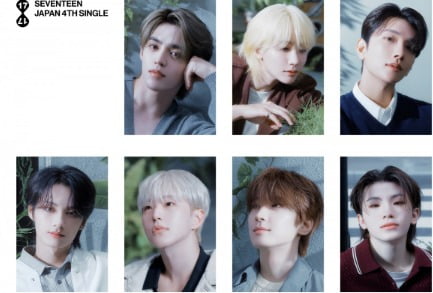[新春기획(5)-엔터테인먼트] 영화 : (전문가 기고) '전문가 길러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고위험'' 감안 전문가 길러야 ]
지난 1년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증시폭락 속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영화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영화의 경우 투자에서 자금회수까지 평균 11개월 정도로 투자회수기간이 짧고 투자자금이 순차적으로 들어가 자금 유동성 관리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99년 "쉬리"와 지난해 JSA공동경비구역 등 수익률이 3백%가 넘는 굵직굵직한 흥행작들이 한국영화에서 속속 등장하면서 지난해말에는 무려 9개 창투사에서 9백억원에 가까운 영상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기도 했다.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연간 한국영화제작에 소요되는 제작비는 약 8백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비해 CJ엔터테인먼트나 시네마서비스 등 배급 및 투자사와 KTB네트워크 미래에셋 산은캐피탈 드림벤처캐티탈 등의 투자사,그리고 창투사들이 결성한 영상전문투자조합까지 모두 합한다면 금액상으로는 1천5백억원 규모의 자금이 한국영화제작에 투입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같은 풍부한 자금지원으로 제작자들은 한국시장에서 벗어나 아시아,더 나아가서는 전세계를 겨냥한 수준 높은 작품들의 기획하고 만들 수 있게 됐다.
또 영화에 투자하는 금융사들은 대기업들이 영화투자에 소극적으로 바뀜으로써 발생한 자금 공급의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꿔낸 것으로 평가된다.
강제규필름 명필름 등 유명 제작사들,로커스홀딩스를 지주회사로 둔 시네마서비스와 싸이더스,제일제당에서 분사한 CJ엔터테인먼트 등은 코스닥시장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코스닥등록이 성공하면 영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산업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외형적 청사진과는 달리 실제 영화투자는 상당히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기도 하다.
지난 한 해 동안 개봉된 한국영화는 56편이다.
그 가운데 수익을 낸 영화는 단 10여편에 불과하다.
나머지 40여편에 투자한 투자사는 모두 손해를 봤다는 얘기다.
이익이 나면 수익을 제작사와 반반씩 나누고 손해가 나면 1백% 투자사가 손실을 부담하는 한국적인 영화투자 현실에선 투자사가 손익을 맞추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얘기다.
더구나 요즘처럼 영화 제작비가 인상되고 40억원 이상의 자금을 쏟아부은 블록버스터급 영화제작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선 손실을 보는 영화 한 두편에만 투자한다고 해도 1백억원 규모의 펀드들도 금방 재원이 바닥일 날 수도 있는 셈이다.
결국 30% 이상의 자국영화 시장점유율을 가진 한국의 영화계는 제작비 조달이나 미래산업으로의 산업화가 촉진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고무적이지만 세부 투자상황이나 영화 내실을 살펴보면 여전히 위험한 투자분야라는 결론이 나온다.
바로 이 점이 이제 한국영화산업도 빨리 각 분야의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엔터테인먼트업의 기업가치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그 기업이 코스닥 등록 등의 기업공개를 할 때 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아울러 영화투자 전문가들을 빠른 시일 안에 육성해 영화의 포트폴리오 투자,즉 국내 투자사들 끼리의 공동투자나 해외 투자사와의 협력 제작(Co-Production) 등을 통해서 투자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제작자들이나 연출자는 정말 중요한 영화제작에 전념할 수 있어 경쟁력있는 한국영화를 양산하는 일에만 충실히 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세계적인 우위에 설 수 있는 마지막 산업이라고 언급한다.
그 것은 이 분야가 무엇보다도 두뇌에 의존하고 감각적이기 때문이다.
모처럼 분위기가 좋은 한국영화시장에 무슨 "노다지"라도 있는 양 무조건 돈만 댈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영화인들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성근 < KTB네트워크 엔터테인먼트팀장 >
지난 1년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증시폭락 속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영화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영화의 경우 투자에서 자금회수까지 평균 11개월 정도로 투자회수기간이 짧고 투자자금이 순차적으로 들어가 자금 유동성 관리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99년 "쉬리"와 지난해 JSA공동경비구역 등 수익률이 3백%가 넘는 굵직굵직한 흥행작들이 한국영화에서 속속 등장하면서 지난해말에는 무려 9개 창투사에서 9백억원에 가까운 영상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기도 했다.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연간 한국영화제작에 소요되는 제작비는 약 8백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비해 CJ엔터테인먼트나 시네마서비스 등 배급 및 투자사와 KTB네트워크 미래에셋 산은캐피탈 드림벤처캐티탈 등의 투자사,그리고 창투사들이 결성한 영상전문투자조합까지 모두 합한다면 금액상으로는 1천5백억원 규모의 자금이 한국영화제작에 투입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같은 풍부한 자금지원으로 제작자들은 한국시장에서 벗어나 아시아,더 나아가서는 전세계를 겨냥한 수준 높은 작품들의 기획하고 만들 수 있게 됐다.
또 영화에 투자하는 금융사들은 대기업들이 영화투자에 소극적으로 바뀜으로써 발생한 자금 공급의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꿔낸 것으로 평가된다.
강제규필름 명필름 등 유명 제작사들,로커스홀딩스를 지주회사로 둔 시네마서비스와 싸이더스,제일제당에서 분사한 CJ엔터테인먼트 등은 코스닥시장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코스닥등록이 성공하면 영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산업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외형적 청사진과는 달리 실제 영화투자는 상당히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기도 하다.
지난 한 해 동안 개봉된 한국영화는 56편이다.
그 가운데 수익을 낸 영화는 단 10여편에 불과하다.
나머지 40여편에 투자한 투자사는 모두 손해를 봤다는 얘기다.
이익이 나면 수익을 제작사와 반반씩 나누고 손해가 나면 1백% 투자사가 손실을 부담하는 한국적인 영화투자 현실에선 투자사가 손익을 맞추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얘기다.
더구나 요즘처럼 영화 제작비가 인상되고 40억원 이상의 자금을 쏟아부은 블록버스터급 영화제작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선 손실을 보는 영화 한 두편에만 투자한다고 해도 1백억원 규모의 펀드들도 금방 재원이 바닥일 날 수도 있는 셈이다.
결국 30% 이상의 자국영화 시장점유율을 가진 한국의 영화계는 제작비 조달이나 미래산업으로의 산업화가 촉진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고무적이지만 세부 투자상황이나 영화 내실을 살펴보면 여전히 위험한 투자분야라는 결론이 나온다.
바로 이 점이 이제 한국영화산업도 빨리 각 분야의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엔터테인먼트업의 기업가치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그 기업이 코스닥 등록 등의 기업공개를 할 때 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아울러 영화투자 전문가들을 빠른 시일 안에 육성해 영화의 포트폴리오 투자,즉 국내 투자사들 끼리의 공동투자나 해외 투자사와의 협력 제작(Co-Production) 등을 통해서 투자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제작자들이나 연출자는 정말 중요한 영화제작에 전념할 수 있어 경쟁력있는 한국영화를 양산하는 일에만 충실히 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세계적인 우위에 설 수 있는 마지막 산업이라고 언급한다.
그 것은 이 분야가 무엇보다도 두뇌에 의존하고 감각적이기 때문이다.
모처럼 분위기가 좋은 한국영화시장에 무슨 "노다지"라도 있는 양 무조건 돈만 댈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영화인들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성근 < KTB네트워크 엔터테인먼트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