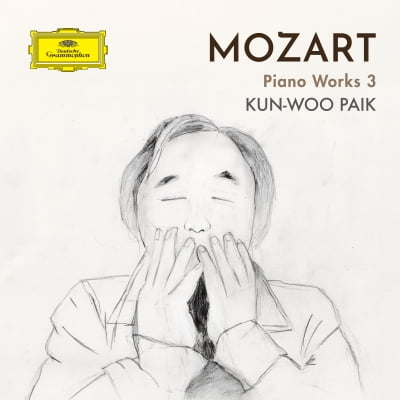산문으로 훑어낸 '삶의 고달픔' .. '자전거 여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술마신 뒷날 아침,간밤의 그 미칠듯한 슬픔과 미움과 악다구니속에서,그래도 배가 고파서 집어먹은 두부김치며 낙지국수가 똥의 원만한 조화에 도달하지 못한채 반쯤 삭아서 가늘게 새어나올때,나는 화장실에서 처자식 몰래 울었다.육신을 먹여주고 쓰다듬어주지 못한채 육신과 싸우고 나온 날똥.덜 삭은 재료가 덜 삭은 비명을 질러댔다''
우리 시대 최고 산문가 중의 하나인 김훈씨의 에세이 ''자전거여행''(생각의나무·9천원)이 출간됐다.
''밥''을 벌기 위해 ''날똥''같은 인생을 팔아야하는 52세 저널리스트의 슬픔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가장 뜨거운 날에 가장 굵고 향기로운 소금이 ''온다''고 했던가.
슬픔을 연해 되새김질하는 김씨의 눈길은 먹이사슬 맨 밑바닥의 처연한 삶을 보듬는다.
''공깃돌만한 콩털게도 애처로운 갑옷을 입고 있다.아무런 방어의지도 없는 그것은 다만 본능의 머나먼 흔적처럼 보인다.끊임없이 흙을 뱉어 새 구멍을 내는 갯지렁이.그의 기구한 무주택의 운명은 갯벌에 지속적으로 산소를 불어넣어 많은 살아 있는 것들의 터전으로 만든다''
김씨의 산문을 읽는 즐거움은 홑으로 된 글이 겹으로 열리는 신비다.
저자는 그림자로 존재하는 산수유꽃이나 더이상 자라지 않고 단단해지는 대나무에 대해 말할 뿐이지만 독자는 거기서 삶의 알레고리를 읽어낸다.
차에 대한 다음 글을 보자.
''찻잎에는 독성이 있다.덖음은 차의 독성을 제거하고 잎속의 차맛을 물에 용해될수 있는 상태로 끌어내는 일이다.그날 딴 차는 하루를 넘기면 안된다.무쇠솥에 찻잎을 넣고 두손으로 주물러가며 볶아낸다.덖음질을 오래한 사람들은 열 때문에 손마디가 구부러져있다.
불은 흔들려서도 안되고 연기가 나서도 안된다''
덖음질은 예술창작과 같다.
독한 마음자리가 없으면 작품이 잉태되지 않는다.
원한과 치욕을 녹여 무기이자 악기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작가는 열손가락이 오그라드는 고통을 감내한다.
그의 관찰력과 상상력은 삶의 고단함에 기초한다.
감은사지 3층석탑에서 나무에서 돌로 이행하는 과정의 망설임을 읽어내고 안동하회마을 골목에서 ''도저히 버릴수 없는 욕망을 비스듬히 껴안고 가는 이의 품격''을 논하는 이는 아마 김씨뿐일듯 싶다.
문학평론가 정끝별씨는 "진정 깊은 것들은 깊은 것들 속에서 나오게 마련"이라며 "처사(處士)김훈의 언(言)과 변(辯)은 강(講)과 계(誡)에 가깝다"고 했다.
삶의 허무를 ''가장 빈곤한 한 줌 언어''로 감싸안은 김씨의 산문은 ''아,아무것도 만질수 없다하더라도 목숨은 기어코 감미로운 것이다,라고 나는 써야하는가.사랑이여,이 문장은 그대가 써다오''라는 자서(自序)를 달고 있다.
윤승아 기자 ah@hankyung.com
우리 시대 최고 산문가 중의 하나인 김훈씨의 에세이 ''자전거여행''(생각의나무·9천원)이 출간됐다.
''밥''을 벌기 위해 ''날똥''같은 인생을 팔아야하는 52세 저널리스트의 슬픔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가장 뜨거운 날에 가장 굵고 향기로운 소금이 ''온다''고 했던가.
슬픔을 연해 되새김질하는 김씨의 눈길은 먹이사슬 맨 밑바닥의 처연한 삶을 보듬는다.
''공깃돌만한 콩털게도 애처로운 갑옷을 입고 있다.아무런 방어의지도 없는 그것은 다만 본능의 머나먼 흔적처럼 보인다.끊임없이 흙을 뱉어 새 구멍을 내는 갯지렁이.그의 기구한 무주택의 운명은 갯벌에 지속적으로 산소를 불어넣어 많은 살아 있는 것들의 터전으로 만든다''
김씨의 산문을 읽는 즐거움은 홑으로 된 글이 겹으로 열리는 신비다.
저자는 그림자로 존재하는 산수유꽃이나 더이상 자라지 않고 단단해지는 대나무에 대해 말할 뿐이지만 독자는 거기서 삶의 알레고리를 읽어낸다.
차에 대한 다음 글을 보자.
''찻잎에는 독성이 있다.덖음은 차의 독성을 제거하고 잎속의 차맛을 물에 용해될수 있는 상태로 끌어내는 일이다.그날 딴 차는 하루를 넘기면 안된다.무쇠솥에 찻잎을 넣고 두손으로 주물러가며 볶아낸다.덖음질을 오래한 사람들은 열 때문에 손마디가 구부러져있다.
불은 흔들려서도 안되고 연기가 나서도 안된다''
덖음질은 예술창작과 같다.
독한 마음자리가 없으면 작품이 잉태되지 않는다.
원한과 치욕을 녹여 무기이자 악기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작가는 열손가락이 오그라드는 고통을 감내한다.
그의 관찰력과 상상력은 삶의 고단함에 기초한다.
감은사지 3층석탑에서 나무에서 돌로 이행하는 과정의 망설임을 읽어내고 안동하회마을 골목에서 ''도저히 버릴수 없는 욕망을 비스듬히 껴안고 가는 이의 품격''을 논하는 이는 아마 김씨뿐일듯 싶다.
문학평론가 정끝별씨는 "진정 깊은 것들은 깊은 것들 속에서 나오게 마련"이라며 "처사(處士)김훈의 언(言)과 변(辯)은 강(講)과 계(誡)에 가깝다"고 했다.
삶의 허무를 ''가장 빈곤한 한 줌 언어''로 감싸안은 김씨의 산문은 ''아,아무것도 만질수 없다하더라도 목숨은 기어코 감미로운 것이다,라고 나는 써야하는가.사랑이여,이 문장은 그대가 써다오''라는 자서(自序)를 달고 있다.
윤승아 기자 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