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주식 이야기가 단연 화제다.
회사원 주부 학생 등 직종과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직장인들은 근무 시간중에도 일은 하지 않고 사이버 주식거래에 매달린다.
장관들마저 주식투자에 뛰어들어 재미를 봤다면 이건 열풍이라기 보다 차라리 광풍에 가깝다.
광풍의 진원지는 코스닥 시장이다.
주가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흥분하지 않을리 없다.
오르는 주가가 손님을 끌어들이고 손님이 꼬이니 또 주가가 오르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같은 광풍 덕분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시대의 새로운 신화가 잇달아 창조되고 있다.
불과 1~2년 사이에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각광을 받게 된 벤처기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새롬기술 드림라인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의 기업은 이미 싯가총액이 2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웬만한 중견그룹 몇개를 사고도 남는다.
많은 벤처기업인들은 신흥갑부대열에 올라섰다.
투자자들 역시 종목 하나 잘 선택한 덕분에,단타매매 잘한 탓에 일확천금한 성공스토리가 연일 터져 나온다.
나라고 신화창조를 못하란 법이 없다며 새로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줄을 잇는다.
벤처기업들은 워낙 잘 나가고 있다.
회사만 차렸다 하면 엔젤 투자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서로 자금을 대겠다고 난리치는 판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요 들어온 돈만 굴려도 인건비를 대는 정도는 끄떡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다.
지금까지의 벤처기업들은 사실 아무런 검증을 받지 않은 곳들이 너무 많은데다 새로운 벤처들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의 숫자가 급증하면 사업여건도 급변하기 마련이다.
더 이상 차리기만 하면 돈이 들어오는 현상은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적자생존의 원칙이 지배하게 된다.
경쟁에서 탈락하는 벤처기업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면 벤처에 대한 무조건적인 기대도 무너지게 된다.
물론 벤처기업 중에는 훌륭한 아이디어와 상품성을 가진 곳도 무수히 많다.
이런 기업에 대한 평가엔 인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모든 벤처가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사실 벤처란 성공가능성이 실패 가능성 보다 높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름도 벤처로 불린다.
모두의 성공이 보장된다면 그것은 이미 벤처가 아니다.
벤처기업들은 이제 평가받을 만큼은 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어쩌면 이미 고평가 상태로 들어섰는지도 모른다.
미국의 사례에 견줘보자.현대경제연구원이 주요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코스닥 등록기업들의 싯가총액은 매출액의 75배에 이른다.
반면 거래소에 상장된 주요제조업체들의 싯가총액은 매출액의 70% 선에 불과하다.
나스닥 기업들의 경우 싯가총액이 매출액의 59배,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제조업체들은 3.5배다.
물론 미국의 경우가 꼭 옳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시장의 힘이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됐다는 인상은 지우기 어렵다.
벤처기업들이 급증하면서 주식의 희소가치가 줄어들고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점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코스닥 시장은 이미 등록된 회사만도 4백73개에 이르는데다 싯가총액도 1백24조원에 달한다.
유무상 증자도 잇달아 실시되고 있고 새로 등록하겠다는 기업들도 길게 줄을 서 있다.
지금같은 열기가 계속 이어지지 못할 경우 물량압박에 시달릴 수도 있다.
투자자들 역시 이같은 점을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는 듯하다.
코스닥 시장의 매매회전율이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지난해의 경우 코스닥시장의 회전율은 1천1백%에 이르러 나스닥의 3배수준에 달했다.
올들어서도 월간회전율이 1백%를 넘고 있다.
주식 소유자가 한달에 한번이상 모두 바뀌고 있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식을 장기 보유하기 보다는 조금만 이익이 남아도 곧 되팔아 버리는 단타매매에 의존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해당기업의 장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다 폭등한 주가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탓인 듯하다.
덕분에 하루에도 몇번씩 같은 종목을 사고파는 데이트레이더만 양산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광풍은 대략 10년을 주기로 우리 곁을 찾아왔다.
지난 70년대말엔 건설주 붐이 전국을 들끓게 했고 80년대엔 소위 트로이카(건설 무역 금융) 주식들이 증시를 뜨겁게 달구었다.
그리고 90년대 말 불어닥친 것이 IT(정보통신)주식 열풍이다.
광풍의 기세가 등등하던 때 사람들은 이들의 가능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70년대 건설주가 폭등가도를 달리던 시절 오일달러를 배경으로 한 중동시장의 가능성은 정말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다.
무역흑자기조가 정착되는 것처럼 보였던 80년대말 트로이카 주식 열풍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당시의 상황은 일시적인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광풍은 삭풍으로 바뀌었고 재산을 날린 투자자들의 눈물과 한숨이 뒤따랐다.
그리고 10년뒤.투자자들은 지금 IT주식만 좇고 있다.
행여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닌지 곰곰 한번 생각해볼 싯점이다.
bklee@ked.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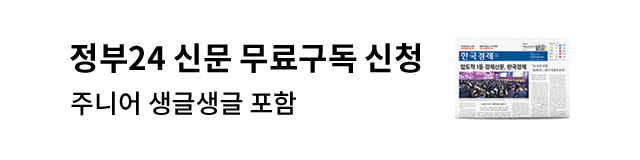
![[기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그린 솔루션](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38696552.3.jpg)
![[한경에세이] 짚신장수·우산장수 자식 둔 심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38549302.3.jpg)
![[데스크 칼럼] 여성·고령자 고용 늘린 日의 비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3347240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