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는 보도는 대형 은행간 합병이 시대적 조류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케미칼은행과 체이스 맨해튼, 트레블러스 그룹과 시티은행, 도쿄은행과
미쓰비시은행, 후지은행과 다이이치간교은행간 합병등 90년대 후반이후의
대형 금융기관합병은 다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다.
이번에 드레스드너와 합치겠다는 도이체 방크는 BTC와 합병한지 1년여만에
다시 합병을 통한 몸집 키우기에 나선 셈이다.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국내은행들도 합병을 통한 대형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이헌재 재경장관이 "국내은행들의 자발적인 합병"을 촉구한 것도 같은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과연 국내 은행간 합병이 가까운 시일안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외국 대형은행들간의 합병외에도 국내은행들에 합병을 요구하는 요인들은
많다.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예금전액을 보장해주는 예금보호법 부칙규정의
효력이 올해말로 끝난다는 점도 그중 하나다.
비교열위에 있는 금융기관에는 예금을 맡기기를 꺼리는 양상이 하반기이후
점차 뚜렷해질 것이고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합병을 통한 대형화등으로
공신력을 높이는 것이 긴요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지만 국내은행간 자발적인 합병이 나오지않을 것으로 보는
까닭은 간단하다.
국내 은행들의 분위기나 의사결정구조등을 감안할 때 그런 결론이 나온다.
정부에서 밀어붙이지 않는 한 어느 은행장이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합병에
선뜻 나설 지도 의문이고, 노조등도 합병움직임에 마뜩지 않다는 반응을
보일 것 또한 점치기 어렵지 않다.
바로 이런 여러가지 요인들을 감안해 2차 금융구조조정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은 은행간 합병들이 촉발할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예금자보호법 부칙규정
은 연장하지 말아야할 것은 당연하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국제적으로도 더욱 강화되는 추세지만 국내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고,BIS비율등 경영내용도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량한 예금자들을 사전적으로 보호하는 길이고, 또
합병을 통한 대형화의 필요성을 은행관계자들에게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 은행들의 자발적인 합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9일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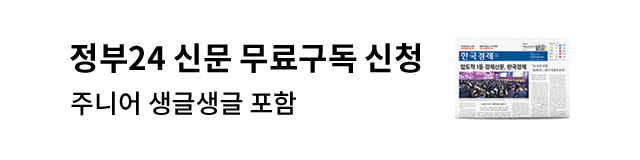
![[기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그린 솔루션](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38696552.3.jpg)
![[한경에세이] 짚신장수·우산장수 자식 둔 심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38549302.3.jpg)
![[데스크 칼럼] 여성·고령자 고용 늘린 日의 비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3347240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