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코너] 초를 켜는 유럽사람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0월 네덜란드의 주택가는 저녁 6시만 넘어도 컴컴해진다.
해가 일찍 떨어지는데다 창에서 흘러나오는 불빛도 대개 침침하다.
자세히 보면 형광등을 환하게 켜둔 방이 많지 않다.
대신 50개에 6천원 하는 초를 사서 태우는 방들이 눈에 띤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분위기도 좋은데다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들이 초를 켜는 진짜 이유는 무서운 에너지요금 때문이다.
네덜란드 에너지환경공사에서 일하는 40대의 알렉산더 오버디에프 씨의 3인
가족이 한달에 내는 전기료와 가스요금은 각각 1백길더와 1백70길더.
한국돈으로 약 5만8천3백원과 9만9천1백원정도다.
창문을 이중창으로 개조하는등 에너지를 꽤 아껴 쓰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요금이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뿐아니라 석유가격도 비싸다.
요즘 파리시내 주유소에서 브리티시 석유회사(BP)상표의 휘발유를 넣으려면
리터당 7.13프랑정도 든다.
우리 돈으로 약 1천4백원이다.
그것도 셀프 서비스가격이다.
네덜란드등 다른 유럽지역에서도 리터당 1천4백원안팎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에 휘발유가격을 크게 높인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비싸다.
에너지가격이 비싸니 알아서 에너지를 아껴쓰라고 하는 이른바 시장원리가
철저히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사람들이 이처럼 비싼 에너지가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각국의
일관성있고 예측가능한 정책때문이다.
유럽 각국은 지난 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겪은뒤 장기 에너지정책을
세워 확고하게 밀고 나가고 있다.
네덜란드는 1차 오일쇼크 뒤인 지난 76년 처음 에너지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지난 96년에는 2020년까지 에너지효율을 33% 높이고 에너지소비의 10%를
대체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액션프로그램"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92년부터 "지역환경계획"(CPE)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를 병행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국제원유가격이 급등한 최근에야 비로소 가격체계
조정등 에너지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휘발유가격인상에 이어 LPG(액화석유가스)가격과 전기요금인상이 기다리고
있다.
소비자들은 갑작스런 에너지가격 대폭 인상방침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유럽의 예와 비교해 보면 우리 정부가 원망을 듣는 진짜 이유는 일이 벌어진
뒤에야 움직인다는 점이 아닐까.
< 암스테르담=김성택 경제부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
해가 일찍 떨어지는데다 창에서 흘러나오는 불빛도 대개 침침하다.
자세히 보면 형광등을 환하게 켜둔 방이 많지 않다.
대신 50개에 6천원 하는 초를 사서 태우는 방들이 눈에 띤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분위기도 좋은데다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들이 초를 켜는 진짜 이유는 무서운 에너지요금 때문이다.
네덜란드 에너지환경공사에서 일하는 40대의 알렉산더 오버디에프 씨의 3인
가족이 한달에 내는 전기료와 가스요금은 각각 1백길더와 1백70길더.
한국돈으로 약 5만8천3백원과 9만9천1백원정도다.
창문을 이중창으로 개조하는등 에너지를 꽤 아껴 쓰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요금이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뿐아니라 석유가격도 비싸다.
요즘 파리시내 주유소에서 브리티시 석유회사(BP)상표의 휘발유를 넣으려면
리터당 7.13프랑정도 든다.
우리 돈으로 약 1천4백원이다.
그것도 셀프 서비스가격이다.
네덜란드등 다른 유럽지역에서도 리터당 1천4백원안팎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에 휘발유가격을 크게 높인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비싸다.
에너지가격이 비싸니 알아서 에너지를 아껴쓰라고 하는 이른바 시장원리가
철저히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사람들이 이처럼 비싼 에너지가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각국의
일관성있고 예측가능한 정책때문이다.
유럽 각국은 지난 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겪은뒤 장기 에너지정책을
세워 확고하게 밀고 나가고 있다.
네덜란드는 1차 오일쇼크 뒤인 지난 76년 처음 에너지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지난 96년에는 2020년까지 에너지효율을 33% 높이고 에너지소비의 10%를
대체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액션프로그램"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92년부터 "지역환경계획"(CPE)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를 병행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국제원유가격이 급등한 최근에야 비로소 가격체계
조정등 에너지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휘발유가격인상에 이어 LPG(액화석유가스)가격과 전기요금인상이 기다리고
있다.
소비자들은 갑작스런 에너지가격 대폭 인상방침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유럽의 예와 비교해 보면 우리 정부가 원망을 듣는 진짜 이유는 일이 벌어진
뒤에야 움직인다는 점이 아닐까.
< 암스테르담=김성택 경제부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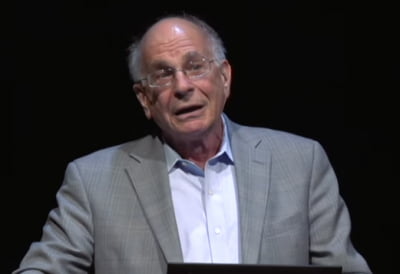
![법무법인 디엘지, 태국에 합작법인 설립…국내 로펌 최초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839531.3.jpg)
![[속보] 트럼프 "4월 2일 상호관세…자동차 관세도 함께 부과"](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ZA.3983935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