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엘니뇨와 라니냐 .. 정진규 <한국시인협회장>
천장에 곰팡이가 퍼렇게 슬어 있다.
물난리를 겪고 있는 수재민들의 모습을 더는 볼수가 없어 텔레비전도 꺼
버렸다.
아무리 여름 장마라지만 잠깐씩 빨래라도 말려 입을 틈을 내 주는 염치가
있기 마련인데 이건 그야말로 막무가내다.
역시 "엘니뇨" "라니냐"라는 이야기다.
정말 게릴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널뛰듯 후려쳐대는
이번 기습 폭우의 주범이 그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왜 그렇게 예쁘게 붙여 놓았을까.
누구의 작품인지 실로 아름다운 정형시가 운율마저 감지케 하는 바가 있다.
엘니뇨 라니냐.
그 음성상징이 아주 둥글고 부드럽다.
숫제 야들야들하다.
고온과 저온이라는 서로 다른 현상을 몰고 온다는 이 두 개의 극악범이
어떻게 그렇게 짝자꿍을 이루는지 빈틈이 없는 완벽한 리듬을 지니고 있다.
의미 또한 그렇다.
스페인어로 엘니뇨는 아기 예수 또는 남자 아이, 라니냐는 여자 아이 또는
귀여운 소녀를 뜻한다고 하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극악스러운 존재들은 그런 모습의 가면을 쓰고 온다는 것인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역설적 기원의 한 표징이라고 해야 할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물을 일러 상선약수,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것은 물과 같다고 한 노자의
해석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천하에서 부드럽고 약하기가 물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치는 데 물보다 나은 것이 없음은 물이 상처를
입지 않는 까닭이다"라고 술회한 데에 이르러서는 섬뜩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
우리 인간들이 그간 너무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자연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인간들의 야만이 저 예쁘기(?) 이를데 없는
엘니뇨를, 라니냐를 불러온 것이 아니겠는가.
장대비 속에서 겸허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긴다.
진정으로 단단한 것은 무엇이며 진정으로 강한 것이 무엇인가를 공부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3일자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행복하기 그리고 잊지 않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629524.3.jpg)
![[특파원 칼럼] 100년 후 연금까지 고민하는 일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564071.3.jpg)
![[홍영식 칼럼] 헌법 전문은 '장바구니'가 아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5703783.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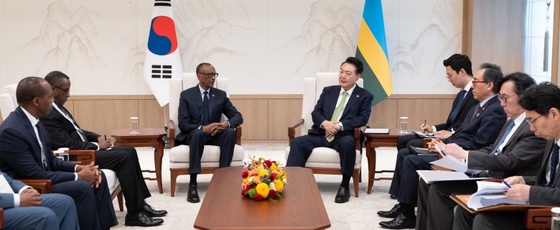


![[단독] 홈플러스,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한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2731.3.jpg)
![[오늘의 arte] 예술인 QUIZ : 가택 연금됐던 러시아의 '反푸틴' 감독](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036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