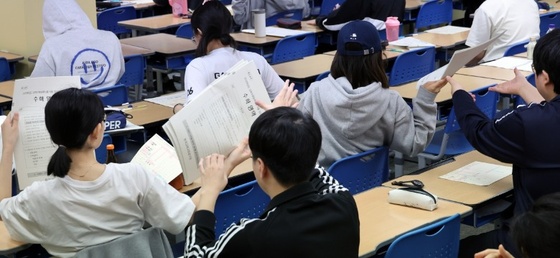[사회I면톱] 기술도 내다파는 '생존 발버둥'..제약자립 위기
제약사에 내다팔고 있다.
이에 따라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다줄 국내 신약1호개발과 완제품 수출에
차질이 빚어져 제약기술자립이 요원해지게 됐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최근 B형 간염치료제인 "L-FMAU"의
상품화권을 미국의 제약벤처기업인 트라이앵글에 팔기로 계약했다.
상품화 이전단계까지는 총 6천8백만달러를 받고 상품화 이후 매출액의
14%를 로열티로 받는다는 조건.
이에 대해 업계는 계약선수금으로 6백만달러가 들어오는 것은 확실하지만
나머지 돈은 까다롭고 복잡한 임상이 성공해야 받을 수 있어 실속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미약품도 면역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을 마이크로에멀전 형태로 양산
하는 기술을 개발, 지난해에 국내외판권을 스위스 노바티스에 매각했다.
이 제품에 관한한 절대적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노바티스가 잠재적인
경쟁제품을 사장시키기 위해 입도선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포함해 국내서는 그동안 총 11건의 신약제법개량기술 및 신약후보
물질에 대한 수출이 있었지만 내실없는 기술수출이 대부분이다.
LG화학 한국화학연구소 유한양행이 신약개발중간단계에서 기술을 매각했지
만 모두 제값을 받지 못했고 외국에서 진행하겠다던 임상시험진행도 중단된
상태다.
제약사의 한 개발담당임원은 "다국적 제약기업이 경쟁기술을 사들여
휴지화시킴으로써 장래에 경쟁품목이 될만한 것들을 싹부터 없애려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제약사들이 이처럼 신약기술을 해외에 내다파는 것은 장기적인 이익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추구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신약기술수출에 대해 업계는 정부가 임상여건조성과 연구비지원에
적극 나서야 하며 제약사들도 보다 분명한 목표를 갖고 신약개발에 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종호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일자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