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규제파괴시대] (7) '임금체계' .. 기업의 입장
지난 3월 개정된 노동법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였다.
이는 고용과 임금의 유연성으로 대별된다.
고용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있었고 법 개정에도 어느정도
반영됐다.
그러나 임금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노사의 첨예한 이해대립 때문에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채 "2차 개혁과제"로 미루어 놓은 상태다.
따라서 노동법의 임금관련 부문을 개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내용을 보면 우선 법정퇴직금은 임의퇴직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퇴직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없을 때 실업보험의 성격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본래의 목적이 소멸되었으므로
법으로 강제할 명분이 약해졌다.
따라서 이를 임의규정으로 전환해 노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시간외 근무수당의 할증률도 조정해야 한다.
고임금시대에 할증률 50%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시간외 근로수당의 할증률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인 25%를 참조해
하향 조정해야 한다.
복잡한 임금관리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단일화가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들이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포기할 정도로 복잡한 임금체계로는
임금의 동기유발 기능이 약화되고 만다.
이밖에 연월차수당 생리휴가제도 월차휴가제도 최저임금제도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치욕을 감수할
지경에 이르렀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임금과 고용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
노사 모두가 가슴을 열고 무한경쟁시대에 어떠한 임금제도가 궁극적으로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지 겸허하게 검토할 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6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데스크 칼럼] 아무 기업이나 상장시킨 대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5978664.3.jpg)
![[월요전망대] 소비자물가 하락세 이어지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20565573.3.jpg)


!["심각한 고평가"…AI 서버 수요 의심 커졌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0106554770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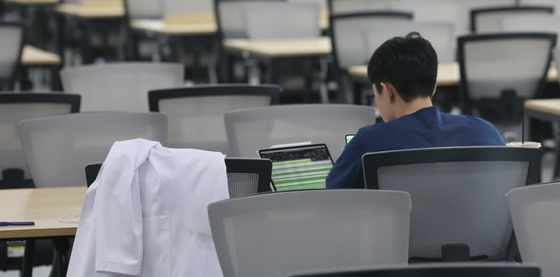


![[이 아침의 문인] 빈민가 출신 소설가 겸 시인…찰스 부코스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0990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