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이모저모] 유럽식 '메세나' 꿍꿍이는 따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그림 음악 등 예술에 대한 유럽인들의 관심은 ''애호'' 차원을 넘어서
''열정'' 그 자체이다.
지난해 9월말 파리에서 문을 연 세잔 특별전시회는 3개월간 60여만명을
끌어들이는 대성황을 이뤘다.
연말 1개월여간의 대규모 파업으로 파리의 교통이 마비되는 혼잡을
겪었으나 전시장은 연일 만원이었다.
지난 5월초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달간 열린 요하네스 베르미어
특별전도 개막 2개월전 이미 관람표가 매진됐다.
유럽인들의 예술에 대한 이같은 열정을 세계적 기업들이 그냥 지나칠리
없다.
사람이 모이니 이를 돈벌이로 연결하려는 갖가지 상술이 등장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특히 인기있는 전시회를 후원, 이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는 고급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전시회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이를 후원해 싼값에 기업 이미지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다국적 컨설팅업체인 언스트&영사가 지난 봄 런던 테이트미술관에서 열린
세잔특별전을 후원,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데 성공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전시회에는 45만명의 관람객이 몰려들어 미술관에 250만파운드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를 후원한 언스트&영도 미술관측 못지않게 재미를 톡톡히 봤다.
이 전람회가 인기를 모으자 이를 후원한 컨설팅업체의 이름이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은 물론 유럽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됐기 때문이다.
비용은 불과 40만파운드.
컨설팅업체에 걸맞은 고급 손님을 끌어들이는데 지불한 비용치고는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닌 셈이다.
언스트&영사는 2년전 테이트미술관이 개최하는 피카소특별전도 후원,
큰 성공을 거두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기업예술후원협회(ABSA)가 20년전
설립됐으며 당시 연간 60만파운드에 불과했던 후원금이 지난해에는 13배가
넘는 8,200만파운드에 이르렀다.
후원사들도 처음에는 이미지개선이 필요한 연초 오일업체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컨설팅 통신 컴퓨터 등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사업에 보조를 아끼지 않아 중소업체들도 적은 돈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또 업체에 따라 선호하는 예술도 다양하다.
브리티시 텔레컴(BT)은 아마추어 극회나 지방 음악제에 대한 후원에
적극적이다.
통신사업이 갖고 있는 대중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BT는 이를 위해 연간 200만파운드를 책정해 놓고 있다.
비슷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로이즈뱅크도 국영TV사인 BBC와 연계,
매년 청소년 음악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벡스사는 전위예술만 후원한다.
예술후원 사업이 미국 등 유럽의 다른 국가에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세금을 줄이거나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이런류의
사업에 나서는게 일반적이다.
후원을 "자선"개념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예술에 광적인 애정을 갖고 있는 유럽에서는 싼 값에 기업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 브뤼셀=김영규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9일자).
''열정'' 그 자체이다.
지난해 9월말 파리에서 문을 연 세잔 특별전시회는 3개월간 60여만명을
끌어들이는 대성황을 이뤘다.
연말 1개월여간의 대규모 파업으로 파리의 교통이 마비되는 혼잡을
겪었으나 전시장은 연일 만원이었다.
지난 5월초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달간 열린 요하네스 베르미어
특별전도 개막 2개월전 이미 관람표가 매진됐다.
유럽인들의 예술에 대한 이같은 열정을 세계적 기업들이 그냥 지나칠리
없다.
사람이 모이니 이를 돈벌이로 연결하려는 갖가지 상술이 등장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특히 인기있는 전시회를 후원, 이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는 고급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전시회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이를 후원해 싼값에 기업 이미지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다국적 컨설팅업체인 언스트&영사가 지난 봄 런던 테이트미술관에서 열린
세잔특별전을 후원,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데 성공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전시회에는 45만명의 관람객이 몰려들어 미술관에 250만파운드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를 후원한 언스트&영도 미술관측 못지않게 재미를 톡톡히 봤다.
이 전람회가 인기를 모으자 이를 후원한 컨설팅업체의 이름이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은 물론 유럽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됐기 때문이다.
비용은 불과 40만파운드.
컨설팅업체에 걸맞은 고급 손님을 끌어들이는데 지불한 비용치고는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닌 셈이다.
언스트&영사는 2년전 테이트미술관이 개최하는 피카소특별전도 후원,
큰 성공을 거두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기업예술후원협회(ABSA)가 20년전
설립됐으며 당시 연간 60만파운드에 불과했던 후원금이 지난해에는 13배가
넘는 8,200만파운드에 이르렀다.
후원사들도 처음에는 이미지개선이 필요한 연초 오일업체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컨설팅 통신 컴퓨터 등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사업에 보조를 아끼지 않아 중소업체들도 적은 돈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또 업체에 따라 선호하는 예술도 다양하다.
브리티시 텔레컴(BT)은 아마추어 극회나 지방 음악제에 대한 후원에
적극적이다.
통신사업이 갖고 있는 대중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BT는 이를 위해 연간 200만파운드를 책정해 놓고 있다.
비슷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로이즈뱅크도 국영TV사인 BBC와 연계,
매년 청소년 음악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벡스사는 전위예술만 후원한다.
예술후원 사업이 미국 등 유럽의 다른 국가에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세금을 줄이거나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이런류의
사업에 나서는게 일반적이다.
후원을 "자선"개념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예술에 광적인 애정을 갖고 있는 유럽에서는 싼 값에 기업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 브뤼셀=김영규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9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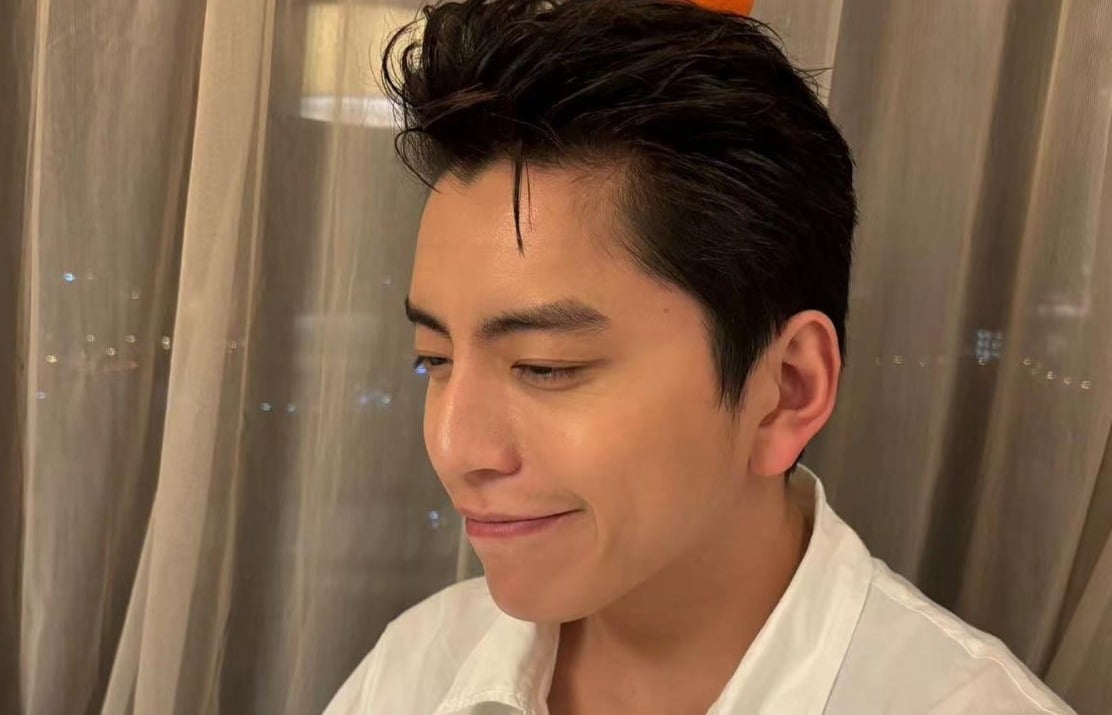
![캐나다, 美에 30조 보복 관세…트럼프는 '재맞불' 예고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70811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