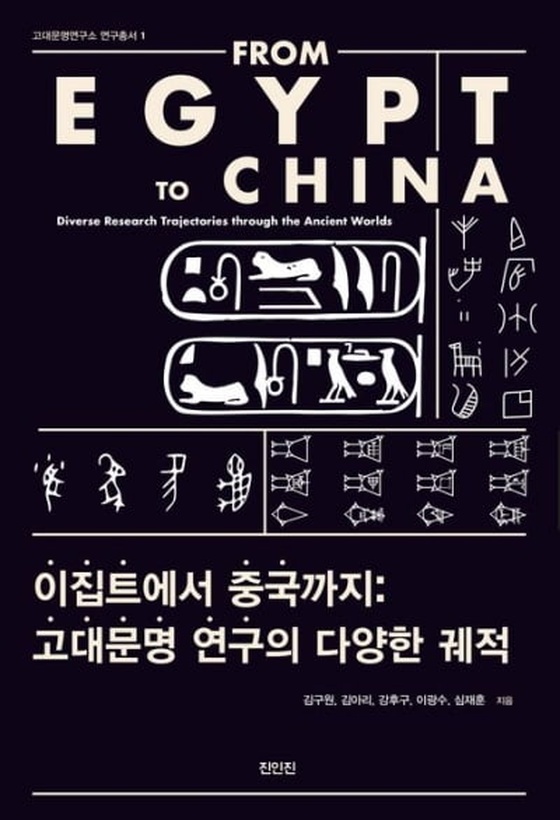[4차 산업혁명 인재 엑소더스] '빅데이터 일자리' 막는 대못규제…젊은 인재들 "한국 돌아가 봤자…"
인재 블랙홀 실리콘밸리
페이스북, 매달 300명 뽑아…중국 '만인계획' 인재 끌어모아
걸음마 시장에 규제 대못
기업 쌓아둔 데이터 많지만 결합 허용안해 산업 못 커
이윤창출 힘드니 채용 줄어
![[4차 산업혁명 인재 엑소더스] '빅데이터 일자리' 막는 대못규제…젊은 인재들 "한국 돌아가 봤자…"](https://img.hankyung.com/photo/201702/AA.13350773.1.jpg)
◆미·중으로 인재 빠져나가는데…
빅데이터 분야가 대표적이다. 서울대 KAIST 등에서 관련 전공을 한 이들 대부분이 미국 실리콘밸리로 가고 있다. 차상균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장(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은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매달 수백 명씩 뽑을 정도로 빅데이터 관련 인력을 무섭게 빨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서울대 석·박사뿐만 아니라 학부 졸업생들도 실리콘밸리에서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최근엔 중국까지 고급 두뇌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다. 선전의 대형 국책연구원이 차 교수를 ‘영입 1순위’로 올려놓고 공을 들이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은 지난달 ‘강선(港深·홍콩과 선전) 창의과학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홍콩과 선전이 맞닿은 뤄마저우(落馬洲) 지구에 ‘중국판 실콘밸리’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2008년부터 해외 석학과 창업가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천인계획(만인계획으로 상향 조정)’과 함께 중국의 ‘인재 싹쓸이’ 전략은 갈수록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규섭 서울대 대외협력부처장(언론정보학부 교수)은 “중국에 가봤자 단물만 빨리고 내쳐질 것이란 우려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직 사례가 드물다”면서도 “하루빨리 국내에 빅데이터산업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걱정했다.
◆‘빅브러더’ 틀에 갇힌 빅데이터
권오성 한국에이온휴잇(IT컨설팅업체) 대표는 “실리콘밸리에선 데이터 분석가가 최고 연봉을 받는 직업”이라고 말했다. 최저 연봉이 20만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국내 현실은 너무 열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하소연이다. ‘규제 대못’이 여전하다 보니 관련 산업이 크지 못하고 빅데이터 전문가를 구하려는 기업 수요도 줄어 인재 양성의 절박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셈이다.
한 교수는 “예를 들어 KT에서 생성된 위치 정보와 비씨카드의 금융 정보를 결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 체계에선 불가능하다”고 했다. 개인 정보 수집과 관련된 법률이 금융 통신 의료 유통 등 분야별로 달라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각 회사들이 쌓아 놓은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지만 이를 결합하지 못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며 “우리나라엔 빅데이터 시장이 없다고 해도 될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정부가 지난해 데이터 결합이 가능하도록 부처별 법률을 개정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다 유야무야됐다.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놓지도 않았다.
‘빅브러더(정보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에 대한 과도한 경계도 넘어야 할 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부주의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자주 발생한 탓에 오히려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