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밝은 미래를 꿈꿔도 될까요?"
창간 51

10년째 3만달러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1인당 국민소득(GNI).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여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2%대로 추락하고 있는 성장잠재력…. 어디서도 밝은 면을 찾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대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60여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성취 DNA’가 우리에겐 남아 있습니다. 질곡의 역사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은 경기 하남시 천현초등학교 2학년 강나연 어린이입니다. 가수 영화배우 운동선수 외교관 등 하루가 다르게 장래희망이 바뀌는 꿈 많은 아이입니다. 마침 5일 여덟 번째 생일을 맞은 나연이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제가 밝은 미래를 꿈꿔도 될까요?”
한국경제신문은 그 답을 찾기 위해 5일자 신문을 특별판으로 제작했습니다. 일반 국민 5000명과 경제전문가 400명에게 설문조사를 벌여 대한민국 현실의 민낯을 드러내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지만, 오늘만큼은 뉴스 보도를 뒤로 돌린 채 우리의 미래를 고민해보려 합니다. 그만큼 우리 현실이 엄혹하고 미래가 위급하기 때문입니다.
차병석 경제부장 chab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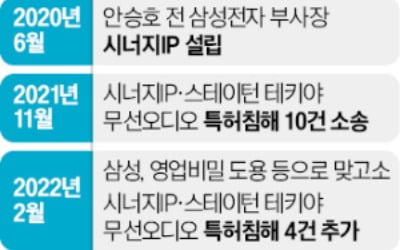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이 아침의 영화감독] 아역 배우서 감독까지, '할리우드 엄친딸'…소피아 코폴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81135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