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과잉복지의 불행을 말할 때다
결국은 행복보다 불행을 키울 것
우리 분에 맞는 복지수준 찾아야
김영봉 <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 kimyb5492@hanmail.net >
![[다산칼럼] 과잉복지의 불행을 말할 때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502/AA.9625919.1.jpg)
이런 때 우리 사회에서 ‘복지-증세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시의적절하다. 최근 3년 연속 목표 세수를 펑크 낸 끝에 지난해 세수 부족이 10조9000억원에 달했다는데 이는 이제 경제와 산업이 나라의 요구에 부응하기에 힘이 부침을 보여주는 증거다.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이 이 시한폭탄의 복지문제를 자신의 이해득실로만 다뤄 이해부득의 선문답으로 우물쭈물 넘기려 한다면 이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간 우리 정치가들은 복지가 가져올 국민행복만 말해왔지 복지지출이 초래할 국민의 불행은 말한 적이 없다. 요사이 모든 정부조직이 복지재원 발굴, 벌과금 징구 등에 나서자 곳곳에서 국민이 울화통을 터뜨리고 있다. 과거 못살던 때에 비해 치안·교육에서 경로당까지 공공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되고 좋아졌다. 공원, 하천, 공중화장실은 깨끗해지고 공무원들은 친절해졌다. 복지에 밀려 정부에 돈이 마르면 도로가 부서지고 공원과 거리에 쓰레기가 넘치고 우범자가 넘치는 것이 모든 복지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과정이다.
그러나 국민의 가장 큰 상실은 경제성장이 단절됨으로써 만날 고용절벽에서 나타날 것이다. 세계가 복지국가의 흐름을 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1960년 평균 27%에서 1996년 48%로 증대했다. 스웨덴은 31%에서 66%로, 그리스는 17%에서 49% 등으로 늘어난 따위다. 이 비율이 25% 미만인 나라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6.6%였지만, 30~40%일 경우 3.8%, 60% 이상은 1.6%로 낮아진다. 즉 정부가 커질수록 성장률은 낮아졌다. 이 조사를 시행한 미국 상원 합동경제위원회(JEC 1998)는 이들 정부의 지출이 늘어난 것은 거의 복지지출 때문이며, 이에 따른 공공부문의 비대화가 민간부문에서의 생산성 성장 기회를 잠식했다고 밝혔다. 과도한 복지지출이 민간기업의 투자와 고용역량을 파괴시켜 성장률 하락과 실업 증대를 초래했음은 이렇게 역사적 자료로 입증된다.
만약 국민을 행복하게 하자는 복지가 오히려 국민의 불행을 요구한다면 공공복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국가복지가 야기하는 국민의 불행이 국민의 행복을 초과하면 이는 ‘과잉복지’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과제는 한국에 적정한 공공복지 수준을 찾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이제는 복지가 가져다주는 행복보다 불행에 대해 더 많은 집단적 사고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한자로 눈을 찡그리는 것이 빈(嚬)이고, 몸을 웅크리는 것이 축(蹙)이어서 ‘빈축’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월나라 천하미인 서시(西施)는 위장병으로 고통을 받아 아플 때면 몸을 웅크리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시의 이런 모습까지 아름답다고 말하자, 옆 동네 동시(東施)라는 추녀가 노상 웅크리고 눈살을 잔뜩 찌푸린 채 돌아다녀 마을 사람들의 놀림을 받았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유럽을 동경해 공공복지 지출도 유럽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풍미한다. 그러나 유럽이 지금 깊이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복지의 늪은 어느 모로 보나 과잉이다. 이렇게 남의 병든 모습까지 동경해 스스로 빈축의 무리가 되는 것은 그간 우리 정치가 주제파악을 못해왔기 때문이다. 근래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복지보다 성장을 선호한다고 나타난다. 이는 우리의 국가지성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며 지금이 복지논쟁을 대폭 증폭시켜야 할 때임을 말하는 것이다.
김영봉 <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 kimyb5492@hanmail.net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데스크 칼럼] 아무 기업이나 상장시킨 대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5978664.3.jpg)
![[월요전망대] 소비자물가 하락세 이어지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20565573.3.jpg)


!["심각한 고평가"…AI 서버 수요 의심 커졌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0106554770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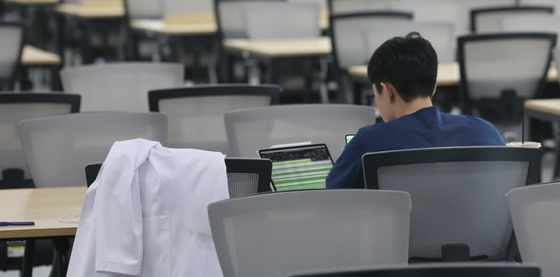


![[이 아침의 문인] 빈민가 출신 소설가 겸 시인…찰스 부코스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0990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