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만드는 방법 제대로 보여준 UAE發 일자리
더구나 UAE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교두보로 지정학적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국가다. 두바이공항이 런던공항에 이어 세계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UAE에 있는 한국 기술자들의 힘찬 함성이 세계로 퍼져나갈 것 같은 기대를 갖게 한다. 그 함성은 물론 70년대 중동에 진출했던 해외건설 근로자의 피와 땀을 기억하고 이를 21세기로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발로일 것이다.
플랜트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전후방 연관효과가 엄청난 산업이다. 제조업의 세 배, 서비스업의 두 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수출에 따른 국가 간 통상마찰 및 수입규제가 적고 외화가득률도 50~60%에 이르고 있다. 원전 플랜트 수출은 보다 정밀한 기술력을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그 효과는 배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새로운 일자리가 어떻게 창출되는지 보여주는 게 대표적 성과다. 일자리는 생산성이 낮고 새로운 일감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쪼개고 나눈들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 소위 사회적 일자리의 허구성이 여기에 있다. 결국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고 투자가 이뤄지는 과정에서만 일감이 생겨나고 그 결과가 바로 일자리다. 원전 플랜트 생태계가 만드는 일자리는 한수원이 예상한 것보다 더 늘어날지 모른다. 지리적 혹은 밸류체인상 인접 시장과의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진화하고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심각한 고평가"…AI 서버 수요 의심 커졌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0106554770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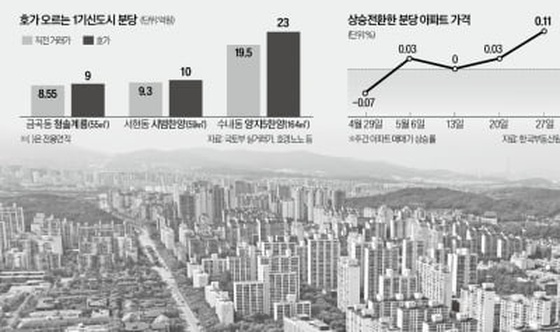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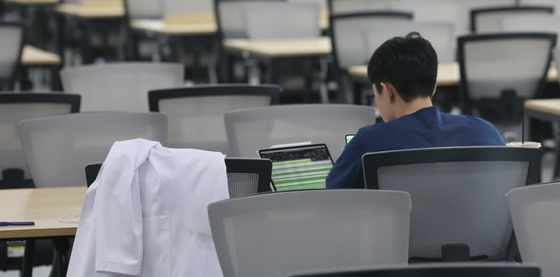


![[이 아침의 문인] 빈민가 출신 소설가 겸 시인…찰스 부코스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0990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