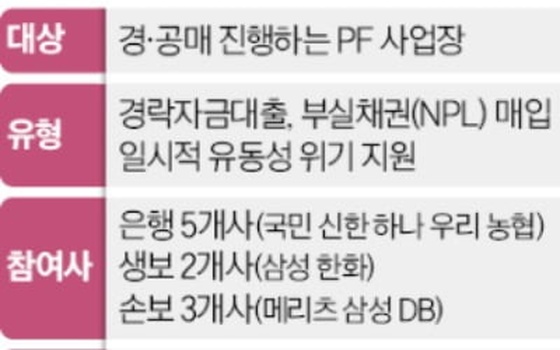"고령화 심각…젊은 일손없어 생산차질 우려"
50~60대 주부가 대부분
봉제는 고용효과 큰 분야…"인력·판로 지원 시급"

이 회사처럼 상봉동·망우동·면목동 등 중랑구 일대엔 옷을 만드는 작은 봉제공장이 산재해 있다. 낡은 빌딩에 4~5개 업체가 입주한 곳도 있다. 티셔츠 블라우스 트레이닝복 등을 주로 만들어 국내 내수 기업이나 수출업체에 납품한다. 이들 중 영주패션은 비교적 큰 업체에 속한다.
중랑패션지원센터에 따르면 중랑구에 있는 봉제업체는 약 1500개에 이른다. 이 중 70% 이상이 종업원 10명 미만 영세업체다. 1970년대에 조금씩 들어섰다가 1980년 이후 서울의 재개발이 본격화돼 아파트촌으로 바뀌자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전체 고용인원은 1만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근로자 대부분은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등 인근 지역 주민으로 파악된다.
이들 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력이다. 직원들 대부분이 50~60대 주부다. 김병희 중랑패션지원센터 센터장(62)은 “중랑구는 단일 행정구역으로는 수도권 최대 봉제업체 밀집 지역인데 대다수 업체가 종업원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사하려는 젊은이가 별로 없어 이런 상태로 5~6년이 지날 경우 기능 인력 대부분이 60세를 넘어 생산 차질을 빚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젊은이들이 이곳을 기피하는 것은 작업 환경이 열악한데다 임금이 월 180만~200만원(잔업 포함) 수준에 불과해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계절상품별 주문 편차가 심한 것도 인력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망우동에서 스포츠웨어를 생산하는 탑의 유승효 사장(55)은 “봄·여름 상품 주문은 가을·겨울 상품의 3분의 1에 불과해 인력 관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봉제 산업도 패션 산업의 일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할 만한 데도 중앙정부가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한다.
인근에 있는 티셔츠 생산업체 준어패럴의 조홍연 사장(50)은 “정부 지원책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지만 설령 지원책이 있다고 해도 설명을 들으러 갈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도움이라면 서울시가 2009년부터 한국의류산업협회에 위탁해 운영하는 중랑패션지원센터가 고가장비 대여나 봉제기술 교육 등의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정도다.
센터는 이 지역 343개사에 장비를 무료로 쓰도록 하고 있다. 시설 교체 사업도 지원한다.
정혜연 영주패션 사장은 “센터 지원으로 최근 노후 보일러를 에너지절약형 보일러로 교체했고 작업장 내 환기 시설도 새로 설치했다”며 “290만원 정도의 비용을 센터 지원으로 30만원에 해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센터만으로는 1500개 업체 지원이 어렵다. 올해 이 곳의 예산은 5억900만원. 김 센터장은 “봉제 산업은 인력 의존도가 높아 고용 창출 효과가 높고, 패션 연관 산업으로 지원할 만한 데도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며 “봉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력과 판로 분야에서 획기적인 지원 방안이 나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낙훈 중기전문기자 nhk@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알리서 그렇게 쓸어담더니…"막상 써보니 별로에요" 변심 [신현보의 딥데이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ZN.36640747.3.jpg)



!["뜨겁다고 하지 않겠다"…CPI 앞두고 사상 최고가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2010747338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