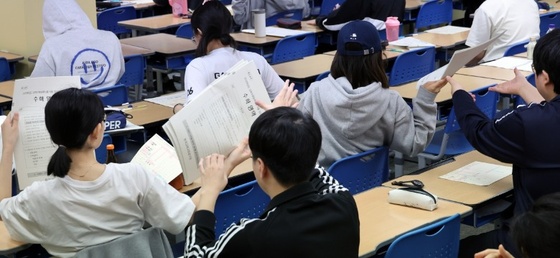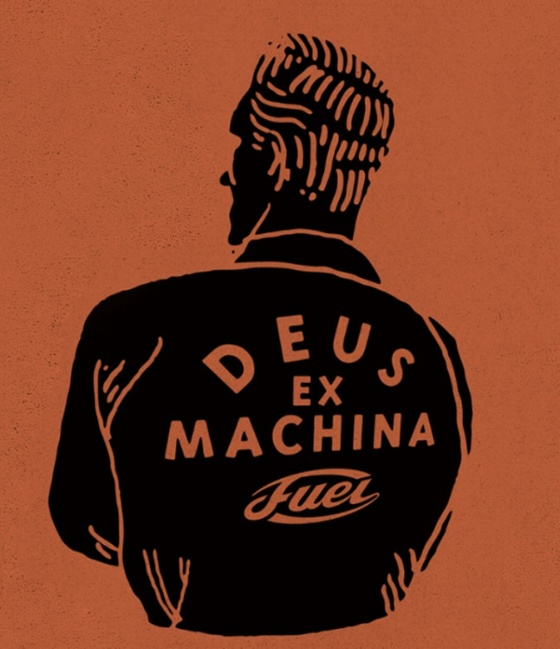[책마을] '모래알' 몽골인 뭉치게 한 '칭기즈칸 리더십'
몽골 초원 따라 풀어낸 역사
마음을 잡는 자, 세상을 잡는다
서정록 지음 / 학고재 / 600쪽 / 2만5000원
인간이 가장 포악해지는 때는 전쟁 중이 아닐까. 계속되는 전란으로 피폐해진 삶에서 인간이 야수로 변하는 경우는 역사 속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11세기 몽골 고원의 상황도 그랬다. 명문 귀족들은 돌궐족과 위구르족이 떠난 초원을 차지하기 위해 격렬한 전쟁을 벌였고 몽골인들은 서로 으르렁대며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몽골인들은 어떻게 하나로 뭉쳤고 통일 후에도 대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동북아 역사를 꾸준히 공부하며 관련 결과를 출간해온 철학자 서정록 씨는 그 해답을 칭기즈칸의 수평적 리더십에서 찾는다. 그는 《마음을 잡는 자, 세상을 잡는다》에서 드넓은 몽골 초원 곳곳에 남겨진 칭기즈칸의 발자취를 따라 여행하며 몽골 제국의 역사와 현실을 접목해 풀어놓는다. 이 여행은 칭기즈칸의 리더십뿐 아니라 바이칼 호에서 출발했다는 한민족의 이동 경로를 밝히고, 동북아를 중심으로 세계사를 보는 관점의 전환을 제공해 독자의 시야를 넓힌다.
저자는 칭기즈칸의 리더십에 주목한다. 칭기즈칸은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귀족들과 달리 꿈과 이상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하층 유목민 병사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몽골 고원의 평화는 자신의 이런 이상을 병사들과 공유할 때만 실현된다고 믿은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했다. 먼저 전리품에 대한 귀족들의 우선권을 없애고 병사들과 귀족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졌다.
이어 천호제와 만호제를 시행해 귀족과 평민, 예속민의 구분을 없애고 오직 능력만으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선정해 양성하는 케식텐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 조치였다. 칭기즈칸의 꿈과 이상에 동의한 대부분의 몽골인들은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랐고 공통의 목표를 가진 단단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었다.
저자는 칭기즈칸이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몽골의 환경 탓에 주변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평화를 원했다고 본다. 원정을 떠나기 전 교역을 원한다는 뜻을 반드시 보냈고 받아들여지면 공존 정책을 폈다는 것이다.
정복과 교역을 통해 몽골은 세력을 넓혔고 1237년 마침내 유럽까지 쳐들어간다. 그 후 유럽인들은 ‘팍스 몽골리아’의 열기 속에 새롭게 ‘동양’을 발견하며 중세의 암흑에서 깨어났다는 게 저자의 시각이다.
신기술과 문물이 도입되면서 다른 세계로의 모험이 시작됐다. 유럽인들이 유라시아 대륙의 초원 길이 아닌 해양으로 눈을 돌린 것도 결과적으론 몽골에서 이동한 돌궐족의 후예 오스만튀르크가 동쪽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민족의 시원이라는 바이칼 호도 주요 여행지다. 저자는 고구려 민족의 기원으로 알려진 코리족과 현재까지 바이칼 주변에 살고 있는 코리 부리야트족은 하나라고 설명한다. 부리야트라는 말이 역사에 출현한 것 자체가 17세기이며 아직도 부리야트인들은 부여와 고구려, 현재의 한국을 모두 ‘솔롱고스’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바이칼에 살던 코리족은 흥안령을 넘어 만주로 왔고, 압록강 근처인 졸본에 도달해 부여와 고구려를 세웠다. 그는 일본과 러시아, 중국 심지어 미국에서도 부리야트인들과 한국인의 관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학자들의 무관심을 안타까워한다.
책은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기행문과 역사서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인으로서의 관점을 놓치지 않는 게 미덕이다. 몽골 초원 곳곳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저자의 기행을 따라가는 재미를 더한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美구인구직 800만건대 초반으로 급감…노동시장 냉각 [속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2.2257924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