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국가의 흥망성쇠 가르는 키워드는 '포용'이다
'개방적' 남한 '폐쇄적' 북한이 국가 성패 모델의 본보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애쓰모글루 외 지음 / 최완규 옮김 / 시공사 / 704쪽 / 2만5000원
대런 애쓰모글루 미 MIT 경제학과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가 이 질문에 답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통해서다. 저자들은 역사 속 증거를 토대로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드러내 보인다. 로마제국, 마야의 도시국가, 중세 베네치아, 구 소련,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미국 등 세계의 역사를 낱낱이 훑은 결과다. 저자들이 내놓은 결론은 간단명료하다. 불평등의 역사적 기원은 첫째도 제도, 둘째도 제도, 셋째도 제도라는 것이다.
저자들은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가 국가의 성패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한다.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며, 신기술과 기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정치·경제 제도를 갖춘 나라만이 가난에서 벗어나 부를 일굴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지배계층만을 위한 권위적이고 수탈적인 정치 제도를 기반으로 한 착취적 경제 제도로는 정체와 빈곤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노갤러스란 도시 이야기로 논지를 이끈다. 노갤러스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걸쳐 있는 도시다. 지리적 위치나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한몸 같은 이 도시 주민들의 형편은 국경 담장을 사이에 두고 극명하게 갈린다. 멕시코 쪽 주민의 평균 가계 수입은 미국 쪽 주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평균 수명도 짧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사업을 하기도 어렵다. 두 지역의 이런 대조는 미국과 멕시코의 정치·경제 제도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널리 알려진 대로 지리적 위치의 차이가 빈부격차를 결정한다는 ‘지리적 위치 가설’, 문화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문화적 요인 가설’로는 이 ‘노갤러스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한다. 이들 가설이 같은 한반도에 있는 남한과 북한의 경제사정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면서 저자들은 서로 다른 지역과 나라의 정치·경제 제도가 차이나는 이유를 찾아 그 역사의 뿌리까지 파헤친다.
저자들은 한 나라의 번영과 빈곤이 어떤 차이에서 비롯되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기존 정치·경제 질서의 균형을 뒤흔들었던 중대 사건의 배경과 추이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른바 ‘결정적 분기점’이라는 것인데, 14세기 유럽 인구의 절반을 앗아간 흑사병, 서유럽에 부의 기회를 가져다준 대서양 무역항로 발견, 세계 경제 구도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산업혁명 등이 꼽힌다. 이런 결정적 분기점에 맞닥뜨린 각 사회의 대응 양상에 따라 정치·경제적 환경이 비슷했던 나라들이 나중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흑사병이 횡행하면서 서유럽에서는 봉건제도가 몰락한 반면 동유럽에서는 재판농노제로 봉건제가 더욱 공고해지는 결과를 낳은 것이 그렇다. 17세기의 영국은 왕실의 힘이 스페인 등에 비해 약했다. 이로 인해 대서양 무역은 영국에 폭넓은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새 제도가 만들어지는 길을 열어줬다. 반면 스페인은 식민지 착취를 통해 왕실의 힘만 키웠을 뿐이다. 영국 식민지가 건설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포용적 제도가 발달했고, 스페인 정복자들이 깃발을 꽂은 남미에서는 착취적 경제 제도가 뿌리를 내린 게 오늘의 미주대륙에서 발견되는 불평등 환경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물론 권위적이고 착취적인 제도 아래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룰 수는 있다. 중국이 그런 나라다. 그러나 저자들은 중국이 포용적 정치 제도로 방향을 틀지 않는 한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경제성장과 기술변화에는 조지프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가 수반돼야 하는데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를 반대하는 이면에는 이 창조적 파괴에 대한 공포가 숨어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저자들은 포용적 정치·경제 체제가 착취적 체제로 퇴행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는다. 진정한 창조적 파괴를 이루지 못해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된 로마제국, 500년간 동부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던 베네치아의 쇠퇴를 얘기하며 무엇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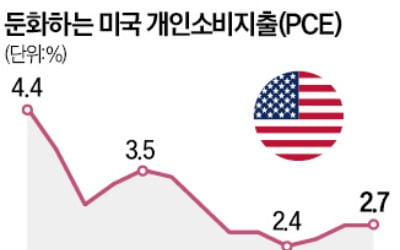


!["심각한 고평가"…AI 서버 수요 의심 커졌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010655477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