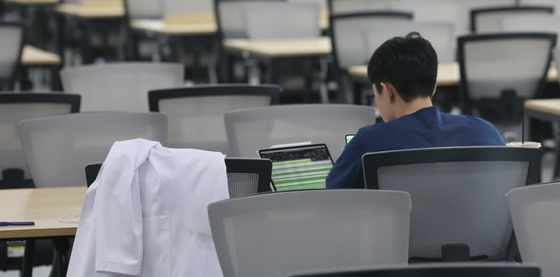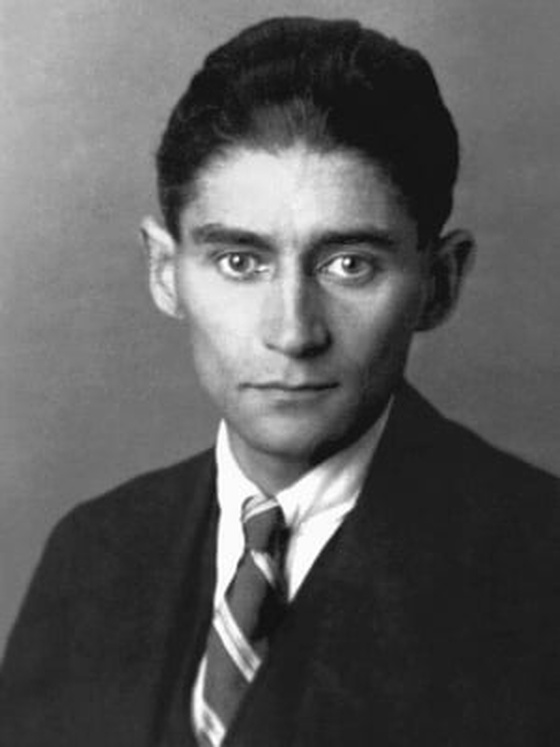[사설] 청와대의 그저 편한대로 일하는 버릇
문제가 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어떤 연유로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됐는지는 아직도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항간에는 협정의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뀌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처리되는 일련의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는 잘못이라고 여러 번 지적했지만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라고 외교부 고위관계자가 실토했다는 것이다.
이런 여러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갑자기 대통령이 체결 절차를 탓했다고 하니 듣는 국민들은 궁금증만 더할 따름이며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혹만 커질 뿐이다. 물론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은 중남미 출장 중이었고 세세한 과정을 보고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처럼 중대한 협정 체결에 대해 사전에 대통령이 몰랐을 리도 없다. 또 그 절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문제가 시끄러워지자 대통령이 마치 자신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것처럼 거리를 두면서 나무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의 일처리가 이런 식이었던 적이 처음도 아니다. 내곡동 사저 문제가 대표적이다. 세종시 문제도 정면대결을 피하고 구렁이 담넘듯 대응하다 실패했다. 꼭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욕을 먹더라도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조금만 복잡한 일이라도 생기면 적당히 어물쩍 처리하고마는 태도가 아예 몸에 밴 것이다. 확고한 원칙이나 철학 없이, 편한대로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광우병 파동 역시 이런 식의 일처리가 낳은 대표적 사례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데스크 칼럼] 아무 기업이나 상장시킨 대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5978664.3.jpg)
![[월요전망대] 소비자물가 하락세 이어지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2056557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