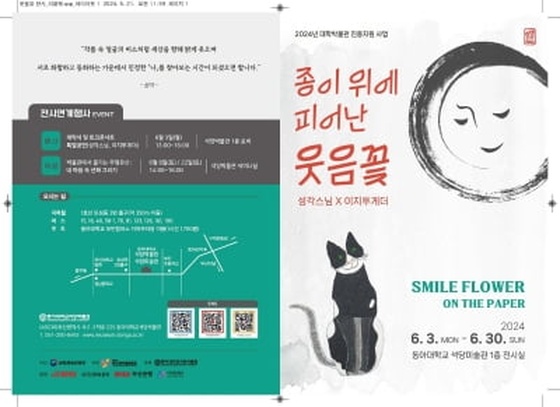[정규재 칼럼] 아무도 재벌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규재 논설실장
![[정규재 칼럼] 아무도 재벌을 좋아하지 않는다](http://editor.hankyung.com:7001/photo/ImageSprayer.jsp?kind=CART&aid=2012021319251&indate=20120213&photoid=201007058425&size=1)
삼성전자가 세계 정상에 올랐고 10년 안에 망한다던 현대자동차 역시 치고 오르고 있다. 재벌 비판론자들은 이 사실을 용납하기 어렵다. 최근의 히스테리는 이런 인지부조화의 결과다. 재벌 오너들은 터널을 파서 회사 재산을 빼돌리고(터널링이라는 그럴 듯한 용어가 있다), 2,3세 오너는 무능해야 마땅하다. 그들은 경쟁 프로세스를 거치지도 않았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지 않으니 이거 곤란하다. 그래서 비판론자들은 더욱 화가 치민다. 그래서 골목 상권과 일감 몰아주기와 원가 후려치기 등 기업경영의 본질에까지 전선을 확대한다. 그렇게 악마적 이미지가 덧씌워진다. 민주당은 재벌을 아예 경제의 독(毒)이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경영학 교수들이 더욱 비판적이라는 것도 아이러니다. 미국 기업을 칭송하고 한국 기업을 비하하는 전통이 있다. 약간은 비열한 전략이다. 미국서 배운 70년대식 기업론을 고수하는 이유다. 오너경영에 대한 공격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S&P 500대 기업의 36%가 소유 경영이다. BMW 까르푸 미쉐린 월마트 베텔스만 발렌베리 등 소유경영 기업은 하늘의 별처럼 많다. 버핏의 벅셔해서웨이도 그렇다.
최근에는 소유경영 기업의 성과가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쌓여간다. 결정이 빠르고 부패가 없고 미래지향적이다. 실제로 최근 자본주의 문제는 소유경영이 아닌 전문경영 체제의 문제로 드러났다. 엔론이 그랬고 GM이 그렇고 대부분 금융사들이 그랬다. 애덤스미스가 돌아오면 아마도 전문경영인 체제를 철폐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개혁의 깃발을 들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가르치고 있다. 오늘날 일본경제의 무력감은 전문경영인 제도가 빚어낸 참사다. 탁월한 예비 후보들은 십자포화를 맞고 경쟁과정에서 일찌감치 탈락한다. 그 결과 ‘적당히 유능하거나 적당히 무능한’ 사람만 후보자로 살아남는다.
중국 정치조차 전문경영인 함정에 빠져 있다. 차기 지도자인 시진핑도 필시 그런 인물일 것이다. ‘중국 지도자들과 대화해보면 대부분 미리 써 온 글만 읽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이말은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다)
물론 무능한 2,3세도 허다하다. 미국에서 파이낸스를 전공하고 돌아온 2세들은 회사들을 거의 다 말아먹었다. 본업 아닌 금융으로 잔재주를 부린 결과다. 이런 2,3세를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려면 역설적이게도 상속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올려주는 것이 맞다. 그런 장치가 없다보니 악순환이 작동한다. 65%라는 징벌적 상속세를 내고나면 회사는 남에게 빼앗긴다. 그래서 기어이 회사 내부로 파고들어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한다. 상속세를 없애고 배당을 현실화하면 2세들은 요트를 타거나 환경운동을 하거나 식물도감을 펼쳐 들고 산을 오르게 될 것이다.
사실 2,3세들도 괴롭다. 능력 밖의 역할을 떠맡는 것부터 그렇다. 부친이 쌓아 올린 성공은 짓누르는 컴플렉스일 뿐이다. 일감몰아주기는 다락 같은 상속세를 우회하여 부친이 일군 것을 물려받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스웨덴 등 대부분 국가들은 그래서 아예 상속세를 폐지해버렸다. 사실 ‘재벌 지배구조’라는 단어부터가 탁상 공론이다. 지배구조와 경영성과는 아무런 논리적 관계가 없다. 제삿상 밤과 대추를 다투는 주자가례식 토론거리 일 뿐이다. 한국 지식인에게서 주자학적 망령은 떼려야 뗄 수도 없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폄훼하는 신(新)사농공상 캠페인이 도를 넘고 있다.
정규재 논설실장 jkj@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포토] 리더들을 키우는 여성리더들 '제30회 차세대 여성리더 컨퍼런스' 열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908065.3.jpg)
![[한경에세이] 내가 클 수 있는 조직으로 간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6609646.3.jpg)
![[토요칼럼] 저렴한 가격은 언제나 옳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6897407.3.jpg)


!["심각한 고평가"…AI 서버 수요 의심 커졌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010655477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