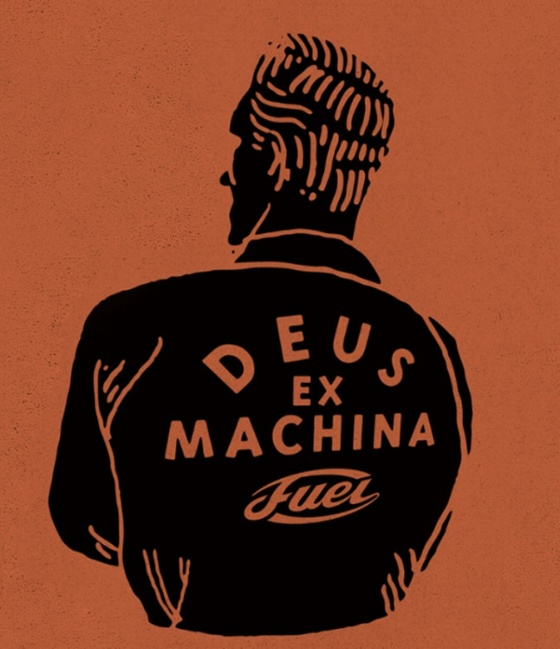가난한 예술인에 거액재산 나눠주고 '자유' 찾은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논고’로 유명한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1889~1951)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는 늘 내적 생활의 풍부함을 추구했다. 23세 때 무작정 버트런드 러셀을 찾아가 논리학을 배웠는데 29세에 ‘논리-철학논고’를 완성해 스승인 러셀을 뛰어넘었다.
1차 세계대전 참전과 은둔을 거쳐 41세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50세에 케임브리지대 철학과 교수로 임용됐지만 부임하지 않았다. 대신 정원사와 약국배달원 일을 하기도 했는데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런 자유로운 삶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비밀은 그의 집안 내력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모제스 마이어)는 왕족가문의 토지관리인이었고 할아버지(헤르만)는 양모무역상으로 큰돈을 벌었다. 이때부터 음악가들과 교류했는데 멘델스존과 브람스는 헤르만의 자녀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다.
아버지인 카를은 제강업으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해 세기말 오스트리아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산업자본가 반열에 올라섰다. 카를은 귀족이 될 수 있는 기회도 거절했다. 귀족을 나타내는 ‘von’을 붙일 경우 오히려 그 표시가 벼락부자로 보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시각예술도 후원했다. 그림과 조각 등 수집품을 모았는데 클림트, 모제르, 로댕의 작품들도 있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마르가레트 비트겐슈타인 스톤보로’라는 그림을 그려 후원에 화답했다. 이 그림은 비트겐슈타인 누이의 결혼식을 맞아 그린 초상화다.
이러한 문화로 카를의 4남 파울은 피아니스트로 큰 성공을 거뒀다. 파울은 1차 세계대전 중에 오른쪽 팔을 잃었지만 한쪽 팔을 잃은 후에도 매우 난해한 곡을 연주했다. 맏딸 헤르미네도 재능 있는 화가였다.
비트겐슈타인도 부모에 뒤질세라 상속재산으로 작가와 예술가를 후원했다. 23세 때 거액을 상속받았는데 이 중 10만크라운(1914년 기준 4000파운드 상당)을 가난한 문인과 예술가에게 내놓았다. 이때 라이너 마리아 릴케를 비롯해 트라클, 달라고가 각각 2만크라운을 받는 등 많은 문인과 예술가들이 후원을 받았다.
남은 상속 재산도 거추장스럽다며 형과 누나에게 나눠줬다. 대신 그는 24세 때부터 노르웨이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살았다. 그게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는 물질적인 외투는 모두 벗어버리고 작은 오두막을 오가며 오로지 논리학의 세계에서 살았다. 4대에 걸쳐 변증법적 진화과정을 거치며 마침내 ‘자유인’이 탄생한 것이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내가 멋진 인생을 살았노라고 친구들에게 전해주십시오”였다.
최효찬 < 연세대 연구원 · 자녀경영연구소장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이 아침의 소설가] '인간 실격' 다자이 오사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6931562.3.jpg)
![[포토] 뮤지컬 '영웅'의 한아름 작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3.3693427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