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 신설법인 재상장 문턱 높인다
한국거래소가 기업 분할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재상장 심사를 강화한다. 기업 분할 재상장에 대한 심사가 신규 상장기업 심사에 비해 크게 느슨한 점을 악용,상장사가 부실사업을 쪼개서 재상장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29일 "분할 재상장에 대한 심사 규정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재상장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장 규정에 따르면 분할기업 재상장 심사는 수익성 요건 등은 없고 자기자본 등 외형적인 요건만 적용한다. 유가증권시장 재상장 요건은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또는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과 매출 200억원 이상 등이다. 코스닥시장은 자본잠식이나 감사의견에 문제가 없고 자기자본 30억원 이상이면 재상장할 수 있다.
기업의 계속성과 투명성 등에 대한 질적 평가를 병행하고 있지만 그동안 재상장에서 탈락한 회사가 거의 없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분할 재상장 수요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00년부터 인적분할(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지분구조가 똑같도록 분할한 경우)에 따라 재상장한 신설법인은 가장 최근에 이뤄진 조선선재까지 총 95개사로 집계된다. 분할을 발표한 이후 재상장을 앞둔 한국화장품 SJM 한미약품 대성산업 피제이메탈 등을 포함하면 100개사에 달한다.
문제는 느슨한 심사를 악용해 부실사업을 쪼개 재상장한 기업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코스닥에 분할 재상장했던 IC코퍼레이션 세신버팔로는 상장폐지됐고,로커스테크놀로지스(현 한솔인티큐브)는 분할 재상장 이후 최대주주가 수차례 바뀌었다. 지난해 3월 파인디앤씨의 휴대폰 부품사업을 분할,코스닥에 상장한 파인테크닉스는 2009년 한 해 영업적자 52억원을 냈다.
올해 재상장과 함께 20배가량 폭등했던 조선선재 사태도 느슨한 재상장 심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신설법인 조선선재의 자본금은 6억원에 불과했지만 거래소는 자본금 확충을 조건으로 재상장을 승인해 결과적으로 이상 급등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분할 존속기업에 대한 상장 심사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상장 심사만 강화할 경우 분할하면서 부실사업이나 자산을 존속법인에 몰아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M&A(인수 · 합병) 업계 관계자는 "분할 재상장 심사의 허점을 노리고 상장사 대주주가 상장법인을 두 개로 늘릴 속셈으로 분할을 감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대주주 입장에선 부실사업을 떼어내고 부실 재상장 기업을 팔아 실속을 챙기겠다는 계산이 깔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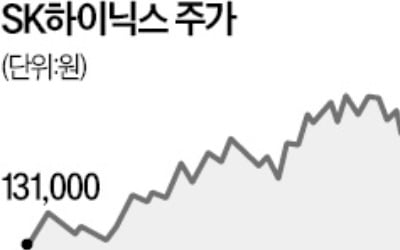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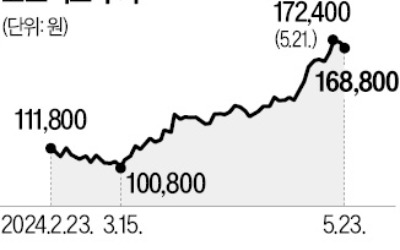








![[단독] '2조' 도박사이트 덮쳤는데…비트코인 1500개 실종 '발칵'](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812278.3.jpg)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