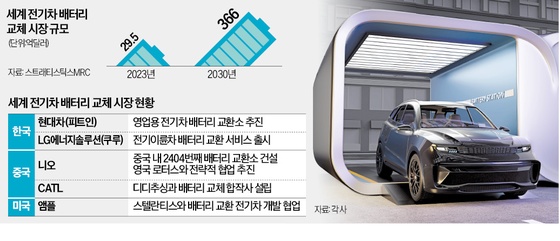[천자칼럼] 바코드 인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는 빅 브라더가 등장한다.그는 송ㆍ수신이 모두 가능한 텔레스크린으로 사회 구석구석을 끊임없이 감시하는데,심지어는 개인의 은밀한 공간이랄 수 있는 화장실에까지 텔레스크린이 설치돼 있다.일거수 일투족이 통제되는 최악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영화나 소설속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람의 피부에 이식하는 생체칩 때문이다.생체칩은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주사기를 통해 체내에 이식하는 쌀알만한 크기의 칩으로,미국식품의약국(FDA)이 2004년 승인한 베리칩(verichip)은 16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다.인간 바코드인 셈인데 당초 제품의 판매 및 재고관리를 위해 고안된 이 바코드가 사람에게 응용되면서 찬ㆍ반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다.
비즈니스 위크 최신호가 이 문제를 보도하고 나섰다.인간 바코드가 아직까지는 알츠하이머 환자나 성범죄자 등을 추적하고 관리하는데 제한적으로 쓰였으나,점차 대상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한다.세계 여러 나라에서 특정인은 물론 갓난아기까지 생체칩의 이식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바코드 인간'에 대한 인권침해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경종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내년부터 애완견에 15자리 숫자코드로 된 인식칩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유기되는 개에 대한 폐해가 심각해서다.앞으로 범죄자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생체칩이 이용될 개연성도 높다.동기야 어떻든 생체칩이 보편화될수록 우리 인간은 '바코드형 상품'이라는 구속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박영배 논설위원 youngba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육성이 경영이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598454.3.jpg)
![[이응준의 시선] 견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23536927.3.jpg)
![[차장 칼럼] 빌라에 새겨진 주홍글씨](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16018106.3.jpg)


![논란의 560억 달러 결국 받는다…"자율주행 전환 큰 진전"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14072306907.jpg)

![[단독] 새마을금고 '특판 예금' 가입했는데…"파산 위기라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01262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