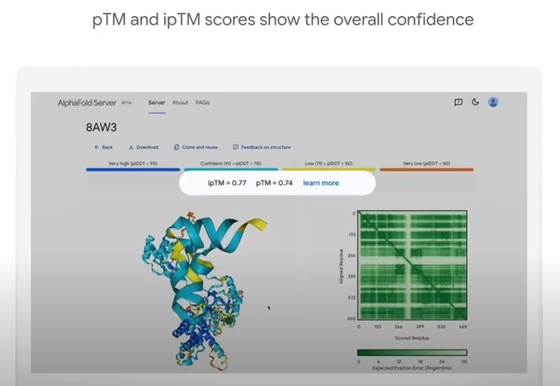흔들리는 빅3…춘추전국 PGA
기세등등 '물오른 샷'…스콧·왓슨·파울러
'1인자의 특별함' 잃은 스피스, 여섯 번 나가 10위권 두 번뿐
상금랭킹 13위까지 밀려나
필 미켈슨·비제이 싱·최경주 등 30~40대 노장도 선두권 노려

올 시즌 6개 대회에 출전한 스피스는 현대토너먼트 우승을 제외하면 10위권에 든 게 두 번뿐이다. 나머지 대회에선 공동 21위, 공동 17위 등으로 ‘지존의 특별함’을 잃었다. 노던트러스트오픈에서는 예선 탈락해 체면을 구겼다. 날카롭던 퍼팅은 밋밋해졌고, 현대토너먼트 대회에서 위력을 발휘한 드라이빙 아이언은 잠잠했다. 세계랭킹 1위를 불안하게 지키는 사이 상금랭킹은 13위(152만달러)까지 밀려났다.
지난해 ‘호주 골프의 부활’을 알린 제이슨 데이(호주)는 더 실망스럽다. 올 들어 출전한 4개 대회에서 현대토너먼트만 상위권(공동 10위)에 들었을 뿐이다. 골프채널은 “지난겨울 가족과 긴 시간을 보내면서 예전의 열기가 식었다”고 평했다. 데이는 이번주 세계랭킹에서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에게 2위 자리를 내줬다.

빅3가 주춤하는 사이 스콧, 버바 왓슨(미국), 리키 파울러(미국)가 오히려 빅3 자리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짧은 퍼터로 갈아탄 스콧은 몸에 대는 그립 방식(앵커링)을 포기하고도 혼다클래식과 캐딜락챔피언십을 연속 제패해 올해 가장 먼저 2승 고지에 올랐다.
왓슨의 기세도 무섭다. 이번 시즌 6개 대회에 출전한 그는 지난해 히어로월드챌린지 대회에서 우승한 뒤 두 달 만에 노던트러스트오픈 우승, 캐딜락챔피언십 준우승으로 훨훨 날았다. 파울러의 상승세도 뚜렷하다. 올해 출전한 5개 대회에서 네 차례 상위권에 드는 등 호시탐탐 빅3 진입을 노리고 있다.
◆30~40대 노장들의 반격
‘절대강자’ 자리가 빈 상황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30~40대 노장들의 선전이다. 올 들어 열린 9개 대회 챔피언 가운데 20대는 스피스(22)와 마쓰야마 히데키(24) 두 명뿐이다. 파비안 고메스(38), 제이슨 더프너(39), 브랜트 스네데커(36), 본 테일러(40), 왓슨(38), 스콧(36)은 모두 30~40대다. 지난 시즌 47개 대회에서 24개 대회를 20대가 제패한 것과는 다른 추세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골프브리핑] 코브라골프, 다크스피드 볼리션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660129.3.jpg)
![[골프브리핑] 테일러메이드, 무신사와 협업해 팝업스토어 오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653711.3.jpg)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금지 '직격탄'...인텔 2.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90647304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