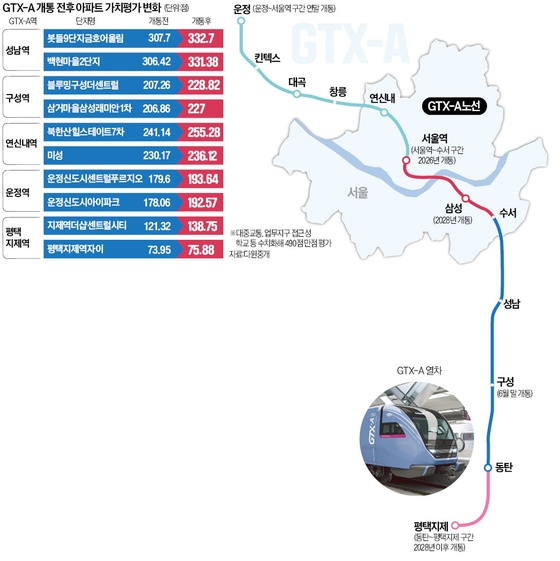예대율 탓 예금이자 높여…대출금리도 들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6) 은행 발목잡는 예대율 규제
선진국은 물론 중국도 폐기
한국만 건전성 위해 중복규제
이달부터 105→100%로 되돌려
은행, 고금리 상품으로 예금 확보
저신용자 대출부터 문턱 높일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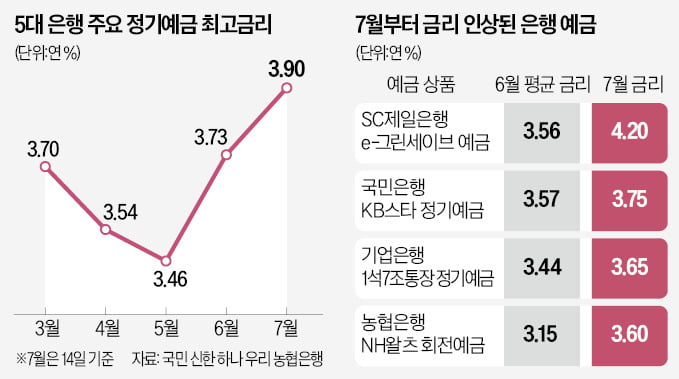
◆LCR·NSFR 규제와 중복
주요 선진국은 예대율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도 은행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미국 은행의 평균 예대율은 작년 말 기준 63.6%로 국내 시중은행(95~97%)보다 낮았다. 예대율 대신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정한 국제표준규제인 바젤Ⅲ에 따라 은행의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다. 바젤Ⅲ는 30일 동안의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의미하는 LCR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국도 이미 LC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1년 내 유출 가능성이 높은 부채 대비 장기 안정적 조달자금 비율을 뜻하는 NSFR 규제도 바젤Ⅲ에 따라 시행 중이다. LCR과 NSFR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예대율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예대율 규제가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 확대를 막는 효과는 있지만 자금 중개 역할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예대율 규제로 은행이 대출을 조이면 저신용자부터 은행 거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대출 공급을 줄이면 서민 등 저신용 고객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금리도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예대율을 75%로 제한하던 중국은 서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2015년 예대율 규제를 없앴다. 당시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예대율 규제가 중소 은행의 농업 개발과 소기업 금융 지원을 제약하기 때문에 이 규제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예대율을 거시건전성 규제를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등 평가지표로서의 중요성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출금리 인상 부채질 우려
은행들은 이달부터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KB스타 정기예금’ 최고 금리를 연 3.75%로 공시했다. 지난달 이 예금의 평균 금리가 연 3.57%인 것을 감안하면 0.18%포인트 인상됐다. 농협은행도 전달 평균 금리가 연 3.15%이던 ‘NH왈츠회전예금’의 최고금리를 연 3.6%로 올렸다. 지난 5월까지 연 3.5%를 밑돌던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금리는 이날 최고 연 3.9%까지 상승했다.예금금리가 연 4%를 웃도는 시중은행 예금도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연 4.2%)과 수협은행 ‘Sh 첫만남 우대예금’(연 4.02%) ‘헤이 정기예금’(연 4.0%), 부산은행 ‘더 특판 정기예금’(연 4.0%) 등 4개나 된다. 지난달만 해도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특판 예금(코드K 정기예금)만 유일하게 연 4%를 넘었다.
예금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자금 조달비용이 늘어나면서 대출금리도 따라 오르고 있다. 지난달까지 연 3%대이던 5대 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는 이달 연 4%대로 뛰었고, 최고 금리는 연 6%를 넘어섰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인상될 전망이다. 예금금리 상승 탓에 변동금리 대출의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의진/김보형 기자 justji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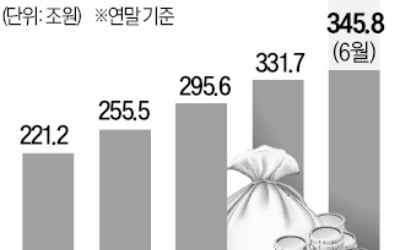
![[단독] 최고금리 인하의 역설…대부업 대출 '반토막'](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99.34017646.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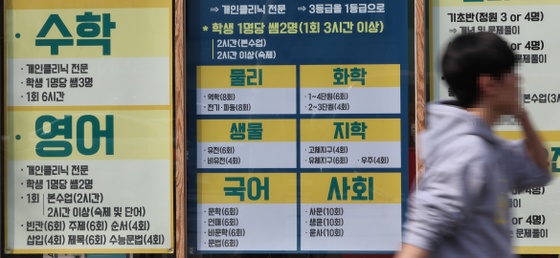

![옥수수 가격 반등…에탄올 수요가 견인 [원자재 포커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5973355.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