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美·中 관세전쟁…"한국 최대 피해자 될 것"
이런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전망은 단견이다. 단기적으로 일부 중국 제품을 대체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관세 장벽으로 전반적인 교역량이 줄어드는 데다 중국 저가 제품이 미국 외 시장으로 쏟아지면서 치열한 가격 경쟁에 내몰리기 때문이다. 한국 수출 중 미국(지난해 기준 18.3%)과 중국(19.8%) 두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경제 봉쇄망 동참 압력이 커지고, 중국은 “대중국 수출 통제에 참여한 국가들은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보복을 노골화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수 있다. 2018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이 동시다발적 보복관세를 예고하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한국은 가장 취약한 국가”라며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의 데자뷔다.
한국은 미국과 가치 동맹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실리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시험대에 올랐다. 모든 민관 네트워크를 동원해 양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선제적으로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관세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은 ‘기술 초격차’다.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철폐는 물론 보조금 등 통 큰 지원에 서둘러 나서야 하는 이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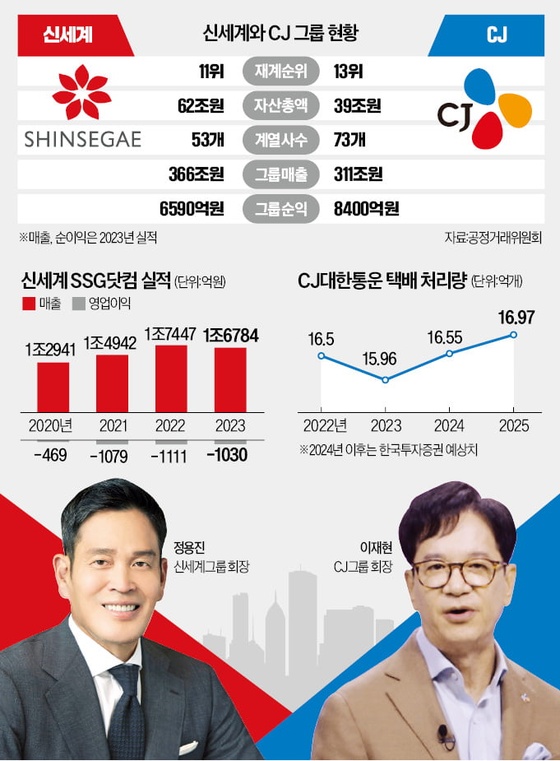





![[오늘의 arte] 티켓 이벤트 : 서울시향 드보르자크 교향곡 8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4448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