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는 왜 파란색이냐구요?… 물이 빠져도 예쁘니까 [서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연이 <옷을 입다 패션을 만들다>
패션 디자이너의 특별한 옷 이야기
파란색 유행은 베르테르에서 시작
패션 디자이너의 특별한 옷 이야기
파란색 유행은 베르테르에서 시작
![청바지는 왜 파란색이냐구요?… 물이 빠져도 예쁘니까 [서평]](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227248.1.jpg)
패션 디자이너 출신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옷을 입다 패션을 만들다> 저자 정연이는 한 교양 수업 시간에 이같은 질문을 받았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즐겨 입는 청바지가 광부의 작업복으로 사용된 데님 원단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것을 왜 파란색 염료로 물들였는지는 굳이 궁금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패션을 전공한 저자 역시 그랬다.
이 책은 청바지를 비롯해 줄무늬 티셔츠, 검정색 미니드레스, 밀리터리룩 등 일상적으로 자리잡은 패션의 역사에 대해 저자가 파고들어 공부한 결과물이다. 저자는 내가 입은 옷이 어디서 시작했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삶이 좀더 풍요롭고 충만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패션은 가끔 표피적이고 가벼운 것으로 오해받지만, 사실 그 속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람과 이상이 녹아 있다는 설명이다.
청바지의 '블루'가 인기를 끈 건 1774년 출간한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부터다. 소설의 대중적 흥행과 더불어 베르테르가 입은 것으로 묘사된 파란색 프록코트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유행'을 했다. 여성들은 베르테르가 사랑한 샤를로테처럼 파랑과 하양이 섞인 드레스를 입었다. 여기에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파란색은 '자유'라는 또 다른 상징을 획득했다. 청색은 곧 시민들이 사랑하는 색깔이 됐다.
![청바지는 왜 파란색이냐구요?… 물이 빠져도 예쁘니까 [서평]](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227220.1.jpg)
이 책은 역사 속 패션의 불편한 진실도 다룬다. 미에 대한 사회 통념에 맞춰 몸을 졸라매는 코르셋은 수백 년 동안 여성을 옷 속에 가뒀다. 일제 강점기 우리 여성들은 한복 대신 일본식 '몸뻬'를 강요당하기도 했으며, 현재 패션 산업은 더 큰 이윤을 위해 저개발 국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모피와 가죽을 얻기 위해 동물을 학대한다.
저자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유행을 좇아 저렴하지만 불필요한 옷을 사는 우리의 소비 습관이 패스트 패션과 기후 위기를 초래한 건 아닌지 묻는다. 당대의 유행에 편승하는 것보다는 각자 살아낸 삶의 방식과 축적한 시간을 통해 몸이 각인된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추는 것이 '패션 피플'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신연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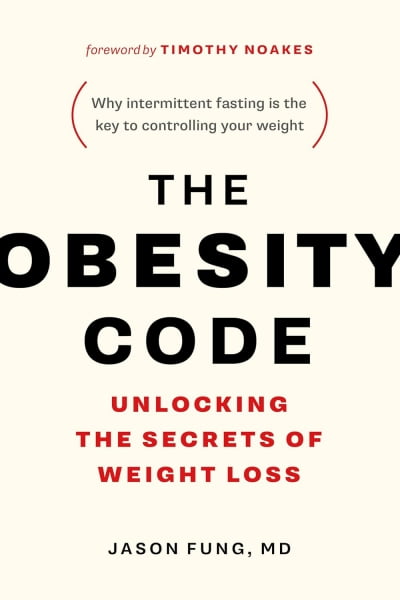
![[단독] '마크 곤잘레스' 덕에 年 400억씩 벌었는데…날벼락](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226969.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