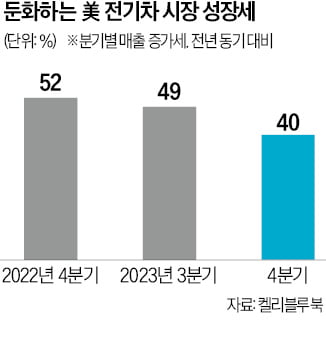국산 픽업, 다시 전성시대 올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토 확대경

그러다 1913년 갈리온올스틸바디컴퍼니가 포드 모델 T를 기반으로 0.5t짜리 픽업을 내놨다. 이어 1917년 포드가 직접 모델 T 뒤에 적재함을 얹은 모델 TT를 출시해 이듬해 4만 대를 팔아치울 만큼 인기를 끌었다. 이런 이유로 픽업의 시작을 포드 모델 TT로 삼는 사람도 많다. 옆에서 모델TT의 인기를 지켜본 닷지도 1924년 모델 TT와 비슷한 픽업트럭을 등장시켰고 제너럴모터스(GM)도 1931년 쉐보레 마스터 기반의 경량 픽업을 제작했다.
물론 내연기관 기반 승용형 픽업 이전에도 픽업 마차는 존재했다. 화물 적재 용량에 따라 말의 숫자만 달라졌을 뿐이다. 하지만 승용과 화물의 겸용을 의미하는 ‘승용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은 제품이 포드 모델 TT였던 셈이다.
이후 픽업트럭은 미국의 실용적인 자동차산업을 상징하는 대표 차량이 됐다. EV어댑션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종은 포드 F시리즈 픽업이었다. 75만 대가 팔렸다. 2위는 쉐보레 실버라도 픽업(55만 대), 3위는 램 1500 픽업(44만 대)이었다. 빅3 브랜드의 주력 픽업이 1~3위를 휩쓴 것이다.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미국이 픽업 시장만큼은 개방을 최대한 미루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 빅3가 지배한다는 점에서 눈독을 들이는 곳이 많다. 경쟁 제품군이 한정돼 틈새만 잘 찾으면 시장을 빼앗아 올 수 있어서다. 연 23만 대가 판매된 도요타 타코마 등이 대표적이다. 이 시장에 한국 기업도 발을 들일 태세다. 현대자동차가 싼타크루즈로 입문을 했다면, 올해 말 기아가 1981년 브리사 픽업 이후 43년 만에 픽업을 생산하며 시장에 가세한다.
반면 국내 승용형 픽업트럭의 인기는 시들해졌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승용형 픽업트럭 등록은 1만9000대에 그쳐 2012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2019년(4만 대)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선택 가능한 제품군이 적은 데다 레저 활동을 대체할 차종이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디젤 선호도가 낮고 고효율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점도 인기 하락을 부추겼다. 국내에서 구매 가능한 픽업은 디젤 또는 기름 소비가 많은 대배기량의 휘발유 엔진이 전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픽업 시장은 늘 가능성이 높은 세그먼트로 분류된다. 무엇보다 실용성과 승용형이 소비자 마음을 잡는다. 넉넉한 적재 공간의 활용도가 높고 화물 분류 덕분에 세금이 적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보다 픽업을 선호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