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슬픔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고통을 말하지 않는 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연민이란 슬퍼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뜻하는 말이었다.
우리 인간이 불운 앞에서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함을 일종의 경이로움으로 받아들일 때 드러나는 마음. 그것이 연민이란 감정의 실체였다.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호주에 이민 온 작가 마리아 투마킨이 쓴 에세이 '고통을 말하지 않는 법'(을유문화사)은 그런 연민에 관한 책이다.
책에는 부서진 영혼들이 등장한다.
전두엽이 발달하기 전 격정적인 감정에 휩쓸려 자살한 10대 청소년들 이야기, 양육권 다툼 끝에 손자를 잃은 유대인 노부부의 사연, 거리를 배회하는 밑바닥 인생들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변호사 이야기 등 다양한 서사가 등장한다.
그 서사는 대개 부서져 있고, 일목요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여러 에피소드가 뒤섞여 있고, 시간 순서까지 뒤죽박죽이다.
개인들의 이야기는 파편처럼 책 전편에 흩어져 있다.
몇몇 에피소드 조각은 백 페이지가 넘게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에세이지만 마치 난해한 문학 작품처럼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 금방 길을 잃어버린 채 헤맬 수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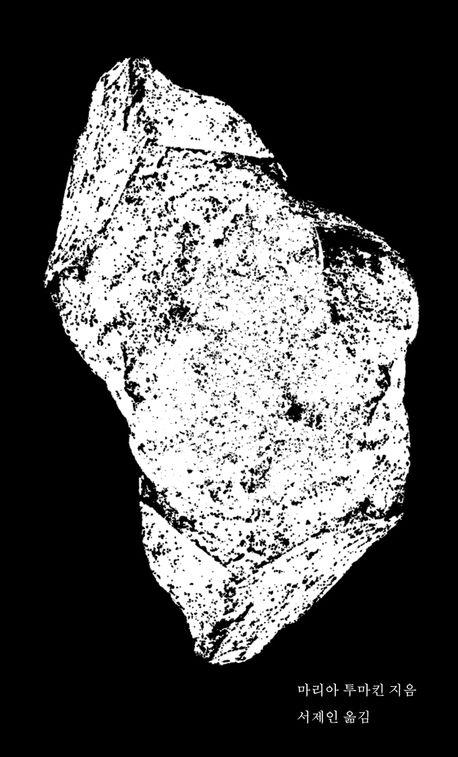
삶은 인과율에 따라 논리적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가령, 비극은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거나 고장 나 버린 부분이 있어야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덜커덕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
최선을 다해 부랑인을 도왔지만, 그 결과는 그의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난해하게 흘러가는 타인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어 그나마 각각의 인격들과 치열하게 소통해야만 어렴풋이라도 그들 마음에 일렁이는 생각의 갈피를 짐작이라도 할 수 있다고 부연한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무시하면 타인들은 곧 상징의 집합체로 변해 버린다.
타인을 온전한 인간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그의 어떤 점이 우리와 다른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며, 또한 그 다른 점을 굳이 비틀어 숭고함에 가까운 무언가로 왜곡하지 않는 것이다.
"
어쩌면 타인에게 가닿는 건 불가능한 목표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부서진 영혼들 앞에서 우리는 일관된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내가 아닌 타인을, 나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론에 다다를 수 없는 영원한 과정이지만 우리가 지녀야 할 덕목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서제인 옮김. 432쪽.
/연합뉴스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