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살릴 방안? 지역에 맡기는 게 최선” [책마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구소멸과 로컬리즘
전영수 지음
라의눈
380쪽|2만5000원
전영수 지음
라의눈
380쪽|2만5000원
![“지역 살릴 방안? 지역에 맡기는 게 최선” [책마을]](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524878.1.jpg)
현실은 반대다. 각 도시는 몰개성적이고, 사람과 기업은 수도권에 몰린다. 지역 불균형을 넘어 지방 소멸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와 관련해 수년 전부터 여러 책이 나왔다.
최근 나온 <인구소멸과 로컬리즘>도 그런 책이다. ‘대한민국 지방도시를 살리는 전략과 아이디어’란 부제를 달았다. 저자 전영수는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다. <소멸 위기의 지방도시는 어떻게 명품도시가 되었나?>, <한국이 소멸한다>, <각자도생 사회> 등 많은 책을 썼다.
결론적으로 시간과 공을 들여 꼭 읽어야 할 책이란 느낌은 안 들었다. 현장 냄새가 안 나는데다 책상에 앉아 깊이 고민한 흔적도 보이지 않아서다. 한국 사례를 깊이 연구한 흔적도 없다. 컨설팅 업체의 보고서처럼 무미건조한 탓에 읽는 재미도 떨어진다.
저자는 지역 활성화의 방안 중 하나로 ‘자치 분권’을 든다. 그간의 지역 활성화에서 주체는 중앙이고, 객체는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지역 스스로가 문제를 규정하고 해결하도록 물꼬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제대로 된 민관협치, 지역 주민의 전원 참여, 자본주의와 인본주의의 결합 등의 개념도 들고나온다. 정주 인구보다 지역을 자주 오가는 관계 인구를 늘리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방안이란 얘기도 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도 편다.
저자는 정부 실패는 충분히 경험했고, 달라진 로컬리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차별화된 지역창발적 모델을 고민할 때”라며 “229개 기초자치단체는 229개의 로컬 모델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다. 맞는 얘기다. 구체성이 떨어지고 두루뭉술한 것만 빼면.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부자가 되는 한방은 없다" [책마을]](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519608.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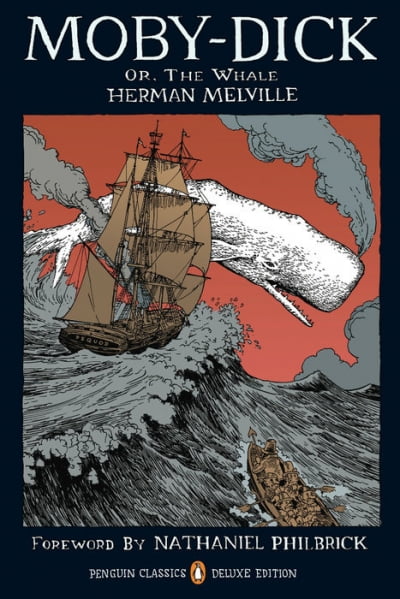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