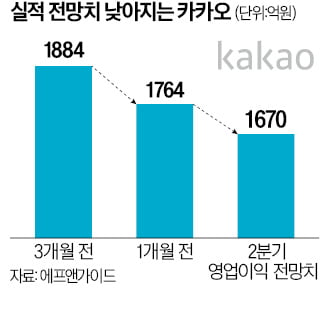한 달간 2500억 가까이 유입
미래에셋·삼성운용 등 상품 내놔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인도로 눈을 돌리는 것은 4%대로 꺾인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탓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인도는 올해도 5%대 후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7월에는 중국을 넘어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익률도 우수하다. 인도펀드의 1년 수익률은 37.38%로 지역별 해외펀드 중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미국펀드의 수익률은 3.48%에 그쳤고 중국펀드는 6.15% 손실을 봤다.
인도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2016년까지만 해도 키움자산운용의 ‘KOSEF 인도Nifty50(합성)’이 유일한 ETF 상품이었지만 이후 대형 운용사들이 뛰어들며 경쟁이 치열해졌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은 지난달 ‘TIGER 인도니프티50’과 ‘KODEX 인도Nifty50’을 각각 상장시켰다. 벤치마크로 ‘니프티 50 인덱스’를 추종하면서 인도거래소(NSE) 우량주 50개 종목을 담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이 지수를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도 같이 내놨다.
정우창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서비스산업과 제조산업을 중심으로 인도의 경제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며 “니프티50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R)도 19.5배로 낮아져 미국 및 신흥국 수준과 비슷해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