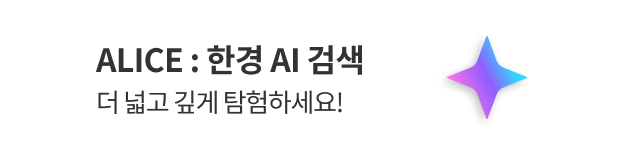김도연(37) 씨가 실종된 것은 2001년 1월 29일이었다.
당시 17세였던 김 씨는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한국콘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종적을 감췄다.
태어날 때부터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고시한 지적장애 1급의 정의는 이렇다.
지능지수(IQ)가 35 미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해 평생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3세 정도에 해당하는 지적 연령을 가졌다는 판정을 받은 김 씨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수준이다.
박 씨는 "말이 어눌한 정도가 아니라 '아빠, 엄마'라고 부를 수조차 없다"며 "17년 동안 단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던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좀 더 크고 나서는 경남의 한 장애인 학교에 보냈고 매일같이 등하굣길을 함께 했다"며 "방학에는 마냥 집에만 둘 수 없어 사설 장애 시설인 학원에 등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겨울 방학을 맞아 학원에서 떠난 수학여행에서 아들이 실종된 것이다.
학원 측은 인솔 교사가 점심을 먹느라 잠시 방치한 사이에 사라졌다고 했다.
박 씨는 "실종 소식을 듣자마자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고,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수학여행 장소였던 콘도 주변은 물론, 인근 야산과 골프장까지 살폈고 실종 아동을 찾는 방송에도 나갔다.
아들을 봤다는 제보도 세 차례나 들어와 신고 장소를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 달 넘게 노숙 생활을 하면서 버틴 탓에 응급실에 실려 간 적도 있었다.
그는 "남편과 생업을 제쳐두고 실종 전단을 만들어 전국 곳곳을 다녔다"며 "10년이 훌쩍 넘게 아이를 찾아다니다 보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 말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당시 초등학생이던 막내아들이 눈에 띄게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던 탓이다.
집안에 실종 아동이 생기면 가족 전체가 고통을 나눠서 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는 눈물을 지었다.
그는 "조금 내려놓기는 했으나 포기하지는 않았다"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청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라면과 바나나 우유, '빠다코코낫'이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라며 "만나기만 하면 모두 사 먹이고 싶다"고 다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실종 당시 김 씨는 키 152cm에 긴 얼굴형을 가졌고, 눈동자 초점이 흐리며 이가 고르지 못한 게 특징이다.
머리 오른쪽에는 10cm 정도의 수술 자국이 있다.
빨간색 티셔츠와 회색 운동복, 검은색 점퍼, 흰색 운동화를 착용했다.
김 씨를 발견했다면 경찰청(☎ 112)이나 실종아동 신고 상담센터(☎ 182)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