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읽으며 떠나는 숲속 바캉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식물과 나'·'가끔은 숲속에 숨고 싶을 때가 있다' 출간
연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바캉스를 떠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피서지로 떠나는 대신 안전한 집에서 숲속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 에세이를 읽으며 무더위를 식혀보는 건 어떨까.
식물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식물 세밀화가 이소영이 쓴 '식물과 나'(글항아리)는 꽃이 피고 지는 자연의 순환 과정을 시간순으로 쓴 에세이다.
식물이 사계절을 나는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봄의 새싹, 여름의 녹음, 가을의 낙엽, 겨울의 황량함보다 더 치열하고 놀라운 삶의 풍경이 펼쳐진다고 저자는 말한다.
또한 식물들의 변화는 봄이라고 해서 온화함과 반가움만 있는 것도, 겨울이라고 해서 시련과 기다림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자는 곁들인다.
그리고 이런 자연의 변화는 삶의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고 한다.
"삶에는 이겨내야 할 추운 겨울이 있으면 꽃을 피우는 따뜻한 봄날도 있다는 것을, 내 손에 쥐어진 작은 알뿌리들이 알려주었다.
"(27쪽)
저자는 교외의 작업실을 찾아와 주는 다정한 사람들, 식물만 바라보고 사는 동료들, 식물의 좋음을 알게 해준 가족 등 삶과 자연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소개한다.
단아한 문장 속을 거닐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을 전해주는 에세이다.
피고 지는 꽃들과 잎들 속에서 계절의 내음도 맡아볼 수 있다.
저자는 "꽃은 피고 진다.
그리고 꽃이 피고 지는 때는 자연의 질서와 규칙 안에 있다.
이 '피고 지는' 과정을 포착하여 기록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말한다.
296쪽. 1만8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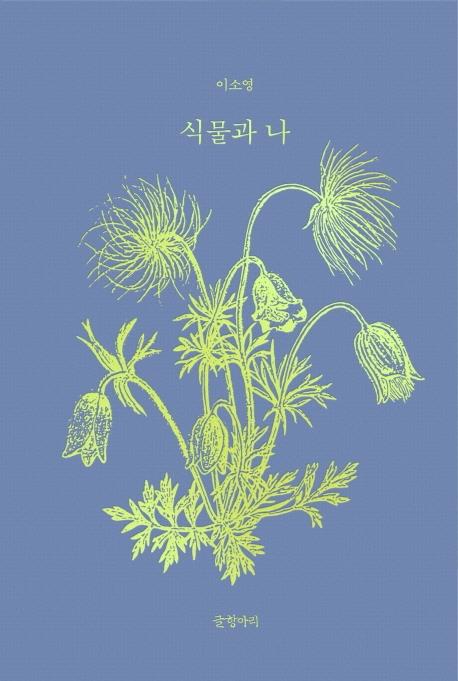
산림교육전문가 김영희가 쓴 '가끔은 숲속에 숨고 싶을 때가 있다'(달)에도 자연을 오랫동안 관찰한 저자의 시선이 녹아있다.
저자는 어려서부터 산골에서 자랐고, 커서는 수목원에서 일했으며 때때로 자연 탐사를 떠나는 등 평생을 자연 가까이에서 살아왔다.
산과 숲에서 우리가 원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는 "지난해 줄기가 땅바닥에 자빠진 모습도 보아야 하고, 주변 밤나무에서 떨어져 겨울 동안 너덜너덜해진 밤송이도 만나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책에는 식물에 대한 전문지식보다는 직접 체험한 일상과 그에 대한 감상이 많이 묻어있다.
갈치조림, 각종 산나물, 청도 반시 등 식도를 자극하는 음식과 여행지 식당, 시골집에 대한 기억,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밤 기차 등의 에피소드를 읽다 보면 어느덧 마음은 여행지로 떠나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책의 맨 뒤 '톺아보기'에는 저자가 탐사하며 직접 찍은 사진들을 수록했다.
208쪽. 1만4천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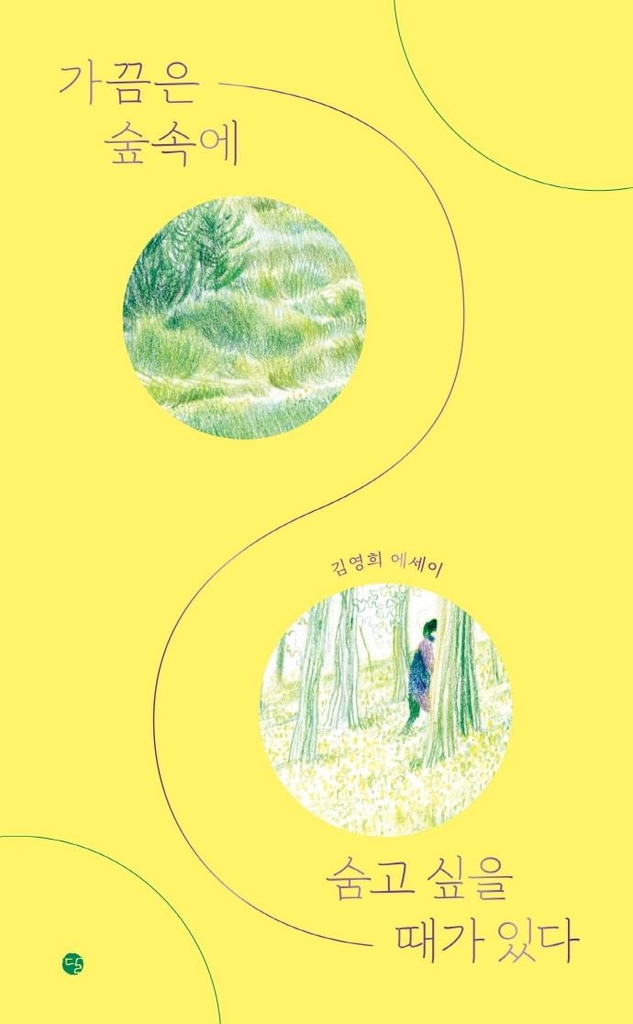
/연합뉴스
연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바캉스를 떠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피서지로 떠나는 대신 안전한 집에서 숲속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 에세이를 읽으며 무더위를 식혀보는 건 어떨까.
식물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식물 세밀화가 이소영이 쓴 '식물과 나'(글항아리)는 꽃이 피고 지는 자연의 순환 과정을 시간순으로 쓴 에세이다.
식물이 사계절을 나는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봄의 새싹, 여름의 녹음, 가을의 낙엽, 겨울의 황량함보다 더 치열하고 놀라운 삶의 풍경이 펼쳐진다고 저자는 말한다.
또한 식물들의 변화는 봄이라고 해서 온화함과 반가움만 있는 것도, 겨울이라고 해서 시련과 기다림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자는 곁들인다.
그리고 이런 자연의 변화는 삶의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고 한다.
"삶에는 이겨내야 할 추운 겨울이 있으면 꽃을 피우는 따뜻한 봄날도 있다는 것을, 내 손에 쥐어진 작은 알뿌리들이 알려주었다.
"(27쪽)
저자는 교외의 작업실을 찾아와 주는 다정한 사람들, 식물만 바라보고 사는 동료들, 식물의 좋음을 알게 해준 가족 등 삶과 자연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소개한다.
단아한 문장 속을 거닐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을 전해주는 에세이다.
피고 지는 꽃들과 잎들 속에서 계절의 내음도 맡아볼 수 있다.
저자는 "꽃은 피고 진다.
그리고 꽃이 피고 지는 때는 자연의 질서와 규칙 안에 있다.
이 '피고 지는' 과정을 포착하여 기록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말한다.
296쪽. 1만8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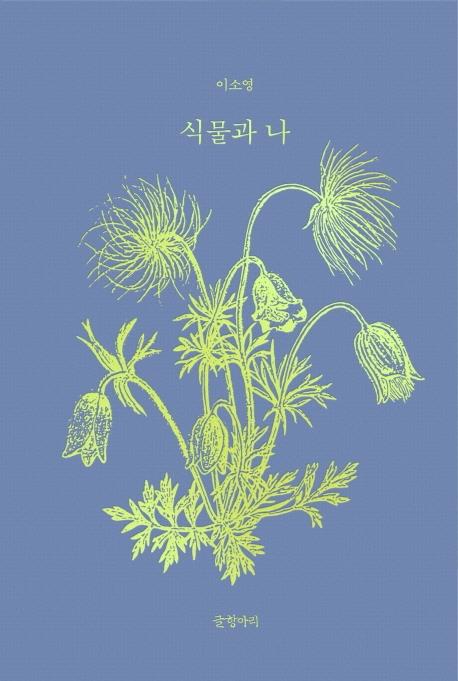
저자는 어려서부터 산골에서 자랐고, 커서는 수목원에서 일했으며 때때로 자연 탐사를 떠나는 등 평생을 자연 가까이에서 살아왔다.
산과 숲에서 우리가 원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는 "지난해 줄기가 땅바닥에 자빠진 모습도 보아야 하고, 주변 밤나무에서 떨어져 겨울 동안 너덜너덜해진 밤송이도 만나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책에는 식물에 대한 전문지식보다는 직접 체험한 일상과 그에 대한 감상이 많이 묻어있다.
갈치조림, 각종 산나물, 청도 반시 등 식도를 자극하는 음식과 여행지 식당, 시골집에 대한 기억,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밤 기차 등의 에피소드를 읽다 보면 어느덧 마음은 여행지로 떠나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책의 맨 뒤 '톺아보기'에는 저자가 탐사하며 직접 찍은 사진들을 수록했다.
208쪽. 1만4천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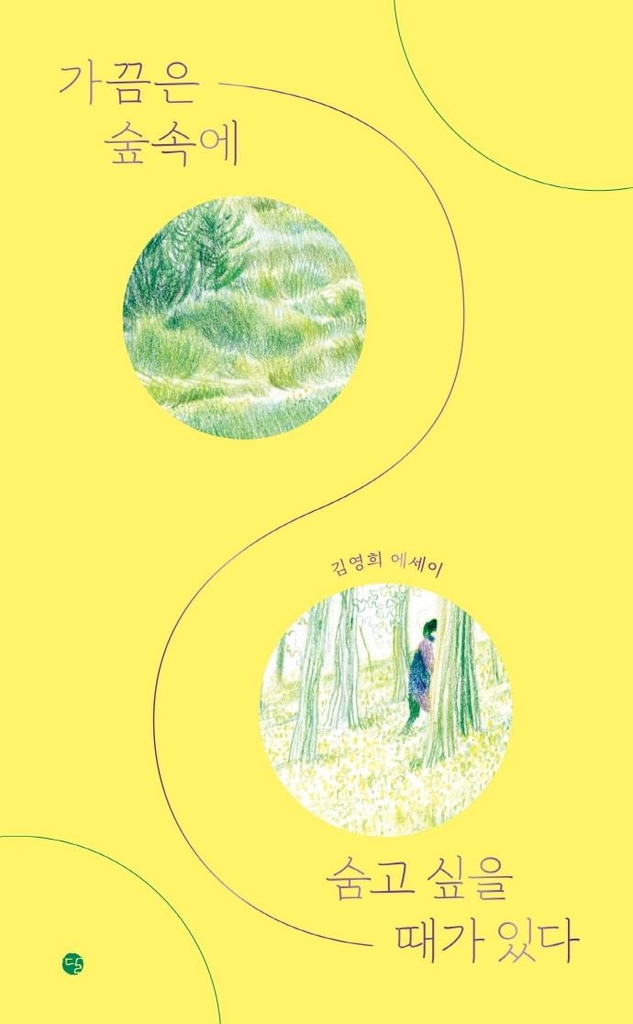
!["콧속에 마늘 넣었더니 신세계"…말 많은 '틱톡 건강팁'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233915.3.jpg)
!["성우 이재명 부고 기사 댓글 봤더니…" 머리 아픈 시민들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ZN.39102261.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