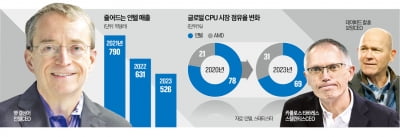수년간 이어진
가격 출혈 경쟁
렌즈·피팅 등
전문 서비스로
생존 모색

지난달 28일 서울 명동 아이닥 안경원. 안경사들이 전날 방문한 고객의 기록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고객이 왜 안경을 불편하게 느꼈는지, 어떻게 처방해 문제를 해결할지 논의가 이어졌다. 이 안경원은 주 4회 스터디 모임(사진)을 한다.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듣기도 한다. 김준근 대표 안경사는 “안경사의 처방에 따라 고객이 느끼는 시감(視感)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안경은 과학이라는 생각으로 전문성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부하는 안경사들이 늘고 있다. 갈수록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자 전문성을 키워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최근 전국 곳곳에는 안경사 스터디 모임도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안경사는 시력 교정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안경을 조제해주는 전문가다. 검안(시력 검사), 안경테 및 렌즈 추천, 안경 조제가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내에선 1989년 안경사 제도가 도입됐다. 안경사가 되려면 대학에서 안경광학을 전공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따면 된다. 국내 안경사 수는 2019년 말 기준 4만4736명이다. 매년 1000~1300명씩 늘어나고 있다.
국가마다 안경사 제도에는 차이가 있다. 일본은 일본안경기술협회(JOA)를 중심으로 민간에서 제도를 운영한다. JOA는 안경사의 학력과 실무 경력, 시험 등을 평가해 S·SS·SSS 세 개 등급으로 엄격히 분류한다. 미국은 시력 검사와 도수 처방을 하는 검안 의사가 따로 있다. 검안에만 약 10만원의 비용이 드는 데다 안경 조제 기간이 2~3주에 달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 안경사들의 실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수년간 가격 출혈 경쟁이 벌어져 안경업계 전체가 흔들려왔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전문화를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선 안경사가 적지 않다. 누진렌즈 전문, 피팅 전문, 고도근시 전문, 수제 뿔테 안경 전문 등 종류도 다양하다.
대한안경사협회는 ‘전문 안경사제’를 도입해 이런 움직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일영 대한안경사협회 윤리법무위원장은 “전문성이 곧 매출로 직결되는 시대”라며 “석·박사 출신 안경사들이 증가하는 등 안경업계에 고급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