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약해도 쓰러지지 않는 소나무…그분들을 찍기 위해 난, 산으로 간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피플스토리 - 한국 최초 여성 클라이밍 사진 작가 '강레아'
19살 첫 등산, 가야산에 반해
내려오자마자 카메라 샀죠
19살 첫 등산, 가야산에 반해
내려오자마자 카메라 샀죠

강 작가는 서울 인사동 갤러리 밈에서 다음달 2일까지 ‘소나무-바위에 깃들다’ 전시를 연다. 북한산 바로 옆 쌍문동 자택에서 지난 5일 그를 만났다. 강 작가는 이곳에서 계절에 따라 변하는 산의 모습을 감상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쓴다. 등반 사진가로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황이 허락하는 날은 산행 및 암벽등반 훈련을 한다. 이따금 촬영을 다녀오고 사진이 쌓이면 전시를 연다. 그렇게 이번 전시회를 포함해 일곱 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산과 사진을 탐구하는 구도자의 삶이다.

구도의 길에는 고통이 따른다. 등반 중인 사람의 얼굴을 찍으려면 암벽에 매달린 채 상체를 밑으로 향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한 손만 써야 할 때가 많다. 무거운 사진기를 한 팔로 계속 지탱하다 보니 팔꿈치 바깥쪽 인대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3년을 버티다 결국 숟가락조차 들 수 없을 지경이 돼서야 수술을 했다.
“재활하는 데 1년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몸의 아픔보다는 산에 올라가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고통이 더 컸습니다. 우울증까지 앓았죠.”

이번 전시 주제는 암벽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다. 강 작가는 소나무를 말할 때 존칭을 썼다. “그분들은 연약하면서도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존재입니다. 가늘고 연한 나무 뿌리가 바위를 파고들어갈 수 있는 건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죠. 인고의 세월을 이겨낸 소나무의 모습에서는 고귀한 아우라, 즉 모방할 수 없는 특유의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강 작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나무의 모습은 첫 등반에서 마주친 ‘인수봉 오아시스 소나무’다. 오아시스는 등반 도중에 사람이 쉴 수 있는 장소다. 이곳에서 수령 100년이 넘는 노송이 흙도 거의 없는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많은 초보 클라이머가 그 뿌리에 체중을 지탱했지만 소나무는 이를 묵묵히 감내했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성인의 모습이 저절로 연상됐다.
강 작가는 이런 아우라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사진을 흑백으로만 찍는다. 화려한 색채는 감각을 어지럽힌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한국의 산은 흑백으로 표현해야 본연의 매력이 살아난다는 이유도 있다.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가 좋은 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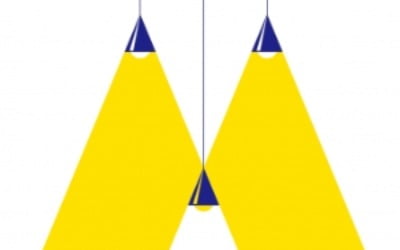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