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거래분석원? 간판 바꿔도 본질은 '감시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급등에 대한 정부의 조바심과 긴박성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3년간 23차례나 이어진 부동산대책과 갈수록 거칠어지는 당국자들의 말에 그대로 담겨 있다. 하지만 초저금리 속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막대한 유동자금과 만성적 공급 부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정책의 유연성과 정밀도를 높일 일이지, 이렇게 행정권과 입법권을 휘두를 일은 아니다. 정책 결정에선 신중하고 냉정할 필요가 있다.
집값 안정기에는 세금이나 축낼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한 우려와 반대여론은 대통령이 ‘기구신설 필요’를 언급한 직후부터 계속 이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초 ‘신중론’을 편 것도 그런 까닭이 있었을 것이다. 공론과정도 없이 누가, 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는지 배경이 궁금하다.
부동산 시장 감시기능은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이미 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특별사법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총망라된 조직이다. 이 정도로 모자라 옥상옥(屋上屋)이 될 전 국민 감시기구를 새로 만들겠다니, ‘오기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지금이야 “감시는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국민에 대한 ‘감시·감독’이 주업무가 될 게 뻔한데도 ‘거래분석원’이라는 간판을 내건 것은 ‘분식(粉飾)행정’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시장 교란을 막겠다”는 취지를 내세우지만 정부가 초래한 교란이고, 빗나간 정책이 빚은 혼란이다.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조직부터 만들고 키우는 ‘파킨슨의 법칙’은 대한민국 정부에 가장 잘 들어맞는 것 같다. ‘빅 브러더’ 정부는 어느날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다.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말과 행동, 은행 통장, 계약서까지 속속들이 다 들여다볼 때 어느덧 그런 통제사회가 돼버리는 것이다. 정부 권한과 감시범위가 크고 강력해질수록 시장과 개인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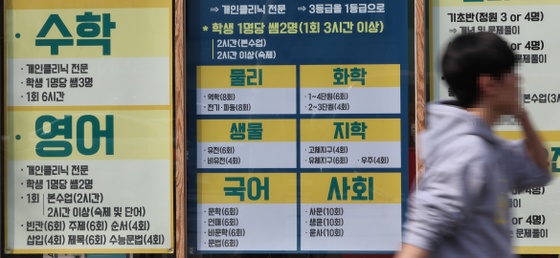

![엔비디아 첫 시총 3조 달러…애플 5개월 만에 3위로 추락 [글로벌마켓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31607295542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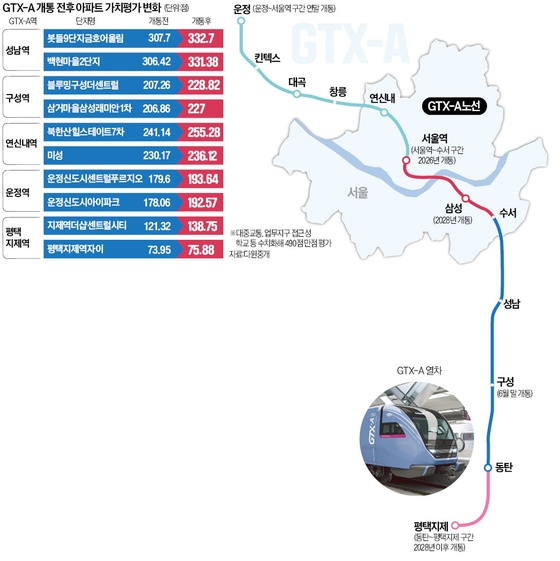







![[이 아침의 발레리노] 중력을 거스른 몸짓…발레를 해방시키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531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