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두 출판사의 의기투합…"양서, 후세에 남겨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폐업하는 '소분샤' 서적 → '고단샤'가 간행 승계
"양서(良書)를 후세에 남겨야죠."
일본에서 망하게 된 출판사가 내놓던 서적류가 절판 위기에 놓이자 다른 출판사가 통째로 이어받아 발간을 계속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대형 출판업체인 고단샤(講談社)는 지난달 30일 문 닫은 소분샤(創文社)의 모든 책을 주문이 들어오면 발간해 주기로 했다.
소분샤는 1951년 창업 이후 인문·사회과학 분야 학술서를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로 명성을 쌓았다.
그러나 출판계의 불황과 학술 논문의 전자화 등으로 매출이 계속 떨어지자 "회복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2016년 폐업을 선언했고, 지난달 마침내 문을 닫았다.
이 때문에 이 회사를 통해 나오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일본어판 '신학대전'(전 45권) 등 1천500종 이상의 양서 가운데 도쿄대학 출판회가 판권을 받은 하이데거 전집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적이 절판 위기에 놓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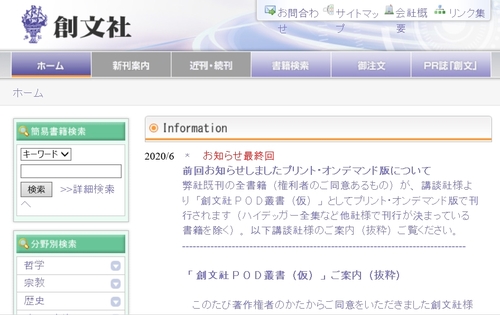
이에 일본의 다른 유력 출판사인 고단샤가 구원 투수로 나섰다.
소분샤가 찍던 책 가운데 저작권자가 동의한 서적을 독자로부터 주문이 들어올 경우 제본해 주는 방식의 주문형 출판(POD)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고단샤는 아울러 전자서적 형태로 제공하는 '소분샤 POD 총서'(가칭) 시리즈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고단샤 관계자는 "둘도 없이 소중한 자산(책)을 손에 넣을 수 없는 상태로 놔두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문화적 손실"이라며 "출판문화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소분샤 서적의 출간을 이어가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소분샤의 구보이 마사아키(久保井正顯·73) 사장은 주문형 출판 방식으로 자사의 책이 계속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학술서 출판이 어려운 지경에 처한 가운데 후세에 책을 남기기 위한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도쿄신문은 "한 출판사가 발간하던 서적을 통째로 다른 출판사가 승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양서를 남기고 싶다는 두 회사의 생각이 결실을 봤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양서(良書)를 후세에 남겨야죠."
일본에서 망하게 된 출판사가 내놓던 서적류가 절판 위기에 놓이자 다른 출판사가 통째로 이어받아 발간을 계속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대형 출판업체인 고단샤(講談社)는 지난달 30일 문 닫은 소분샤(創文社)의 모든 책을 주문이 들어오면 발간해 주기로 했다.
소분샤는 1951년 창업 이후 인문·사회과학 분야 학술서를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로 명성을 쌓았다.
그러나 출판계의 불황과 학술 논문의 전자화 등으로 매출이 계속 떨어지자 "회복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2016년 폐업을 선언했고, 지난달 마침내 문을 닫았다.
이 때문에 이 회사를 통해 나오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일본어판 '신학대전'(전 45권) 등 1천500종 이상의 양서 가운데 도쿄대학 출판회가 판권을 받은 하이데거 전집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적이 절판 위기에 놓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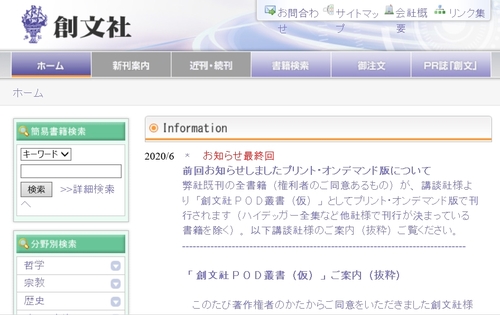
소분샤가 찍던 책 가운데 저작권자가 동의한 서적을 독자로부터 주문이 들어올 경우 제본해 주는 방식의 주문형 출판(POD)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고단샤는 아울러 전자서적 형태로 제공하는 '소분샤 POD 총서'(가칭) 시리즈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고단샤 관계자는 "둘도 없이 소중한 자산(책)을 손에 넣을 수 없는 상태로 놔두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문화적 손실"이라며 "출판문화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소분샤 서적의 출간을 이어가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소분샤의 구보이 마사아키(久保井正顯·73) 사장은 주문형 출판 방식으로 자사의 책이 계속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학술서 출판이 어려운 지경에 처한 가운데 후세에 책을 남기기 위한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도쿄신문은 "한 출판사가 발간하던 서적을 통째로 다른 출판사가 승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양서를 남기고 싶다는 두 회사의 생각이 결실을 봤다고 전했다.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