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톰보이', '미스 비헤이비어'…진정한 자유 꿈꾸는 여성의 자아 찾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리뷰

지난 14일 개봉한 ‘톰보이’는 남자이고 싶은 열 살짜리 여자아이의 이야기다. 주인공 로레의 외모는 남자 같다. 성징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머리에 바지를 즐겨 입는다. 분홍보다 파란색을 좋아하고 또래 남자아이들에게 힘에서도 밀리지 않는다. 로레는 새로 이사간 동네에서 자신을 남자인 ‘미카엘’이라고 속여 여자친구와 사귀지만,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로레의 거짓을 바로잡으려는 게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다. 색다른 취향의 로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달라고 주문한다. 로레에게 속았던 여자친구가 찾아오는 장면이 그것이다. 로레의 여동생이 친구에게 “나는 오빠가 있는데, 언니보다 좋아”라고 말하는 대목도 주제를 강조한다. 로레는 누구나 다른 욕망을 꿈꿀 수 있는 한 인간이라고 역설한다.
카메라는 남자 역할을 하는 로레의 다채로운 얼굴 표정을 클로즈업한다. 그가 느끼는 감정들이 우주의 변화처럼 크게 다가온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으로 지난해 칸영화제 각본상과 퀴어종려상을 받은 시아마 감독의 초창기 작품(2011년)으로 국내에 뒤늦게 선보였다.
오는 27일 개봉하는 ‘미스 비헤이비어’는 1970년 영국에서 열린 미스월드 시상식 현장에 잠입해 성 상품화 반대를 외친 샐리 알렉산더와 조 로빈슨의 실화를 스크린에 옮겼다.
두 주인공은 페미니즘의 양대축을 대변한다. 알렉산더는 남성이 지배하는 제도권에서 여성의 입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여성 해방과 성평등을 이루려는 인물이다. 반면 로빈슨은 제도권을 배척하고 거리에서 구호 투쟁으로 성평등을 이루고자 한다.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여성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제도권의 미스월드 시상식에서 성평등 구호를 외친다.
영화는 미스월드 시상식이 성 상품화 현장임을 고발한다. 여성 후보들은 가슴, 허리, 엉덩이의 신체 사이즈로만 불린다. 하지만 영화는 미스월드 후보들의 인격도 폄훼하지 않는다. 흑인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나온 흑인 후보, 새로운 기회를 얻으려는 백인 후보 등의 사연은 백인 남성이 지배하는 가부장 사회와 인종차별 실태를 질타한다. 코미디언 밥 호프가 가부장 사회의 상징으로 등장해 운동가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장면은 주제를 선명하게 전달한다.
유재혁 대중문화전문기자 yoojh@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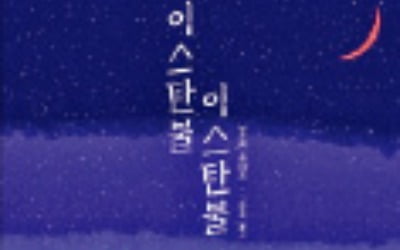

![[리뷰] 드라마 '화양연화', 봄내음 물씬 풍기는 첫사랑의 추억](https://img.hankyung.com/photo/202005/AA.22539435.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