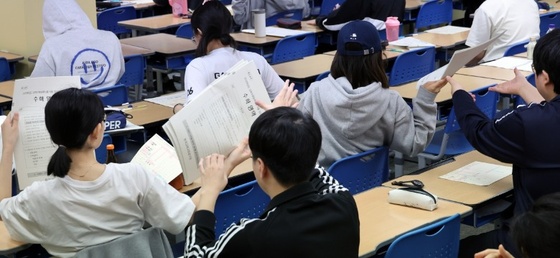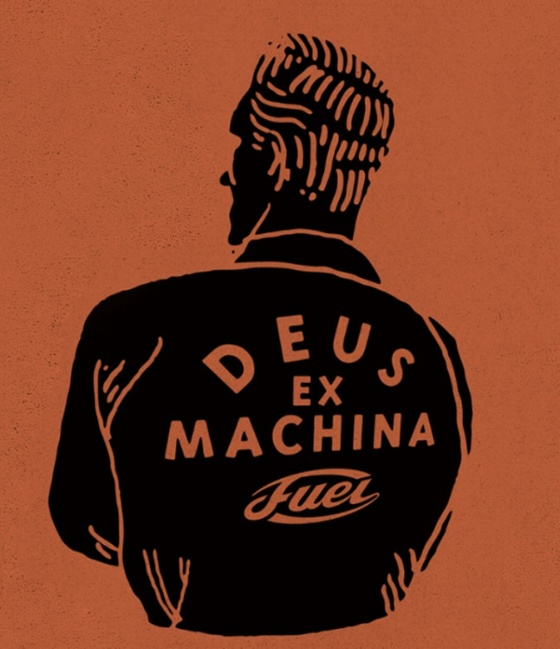대공황 때 다우지수 89% 폭락…25년 지나서야 회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땐 53%↓
제로금리·양적완화로 5년후 前수준
하루새 22%↓ 1987년 '블랙먼데이'
前고점 회복하는데 2년가량 걸려

대공황 직전 다우지수는 호황이었다. 8년간 무려 다섯 배가량 올랐다. 독일은 5년간, 프랑스는 7년간 각각 1080%와 420% 급등했다. 장기 호황으로 ‘거품’이 누적된 게 하락폭을 키운 요인 중 하나였다.
주가 급락은 시장에 ‘패닉(공황)’을 불러왔을 뿐 아니라 세계경제 침체로 번졌다. 세계적으로 기업 도산이 늘고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세계경제 전체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미국은 국민총생산(GNP)이 대공황 기간 3년 만에 50% 감소했다.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는 각각 40%와 82% 급감했고,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다.
미국 경제가 대공황 이전의 GNP 수준을 회복한 건 2차 세계대전으로 전시경제가 가동된 1941년이다. 하지만 경제가 되살아나도 주가는 곧바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우지수가 대공황 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25년이 걸렸다.
가장 최근의 주가 폭락은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위기가 촉발돼 세계로 번졌다. 다우지수는 금융위기 직전 고점인 2007년 10월부터 금융위기가 가라앉은 2009년 3월까지 53% 폭락했다.
리먼브러더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이 문을 닫았고, 제너럴모터스(GM)와 같은 거대기업이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당시 미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 정부는 금융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쏟아부었다. 상당수 중앙은행이 제로금리(0)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내렸을 뿐 아니라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꼽히는 ‘돈풀기(양적완화)’를 통해 시장을 떠받쳤다. 다우지수가 금융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5년이 걸렸다.
하루 기준 다우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때는 1987년 10월 19일 ‘블랙먼데이’였다. 이날 다우지수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하루 만에 22% 폭락했다. 이때 하루 기준 하락률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다우지수는 이후에도 하락세가 이어져 30%가량 떨어졌다. 주가가 블랙먼데이 전 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2년가량 걸렸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