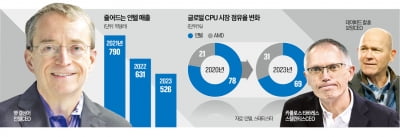'노딜 브렉시트' 땐 타격 불가피
EU "英, 금융규제 따라야" 견제

전문가들은 브렉시트에도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런던 입지가 당장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 런던사무소 관계자는 “금융규제와 인프라 측면에선 아직까지 런던을 따라올 만한 EU 도시가 없다”며 “대부분의 금융 관련 규정이 영어로 표기돼 있다는 것도 런던이 보유한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연내 영국과 EU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실패해 노딜 브렉시트(아무런 합의 없는 영국의 EU 탈퇴)가 발생할 경우다. 런던은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금융사 자금을 끌어들이는 허브 역할을 맡아 왔다. 예를 들어 미국 투자은행(IB)들은 유럽에 투자할 때 런던 법인과 지점을 활용한다. 미국 IB가 EU에서 고용한 인력의 80% 이상이 런던에 몰려 있다. 독일 등 EU 은행들도 런던에서 운용하는 펀드 등을 통해 투자금을 조달한다. 이런 작업은 영국이 EU 회원국일 때는 최소한의 서류 절차만 거치면 됐다.
EU는 영국이 EU 금융규정을 반영하고 경쟁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유럽 시장에 대한 영국 금융산업의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영국 금융사를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EU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영국 자본의 EU 금융시장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영국 경제의 6.9%를 차지하는 금융산업이 막대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상황을 틈타 EU 도시들도 유럽 금융허브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파리, 아일랜드 더블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이 대표적이다. JP모간과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미국 IB들도 런던에서 EU 도시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