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초소형 전기차, 시장 활성화는 '글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륜 오토바이 대체제로 급부상
“중국산에 국세 지원이 웬 말” 지적도
“중국산에 국세 지원이 웬 말” 지적도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초소형 전기차 도입은 급증하는 추세다. 초소형 전기차는 전장 3600mm, 전폭 1500mm, 전고 2000mm 이하 크기에 최고정격출력이 15㎾ 이하인 전기차를 의미한다. 르노삼성자동차의 '트위지'가 대표격이다.
초소형 전기차의 장점은 명확하다. 배달용으로 쓰이는 이륜 오토바이보다 좁은 골목길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으면서 일반 차량보다는 저렴하다. 전기차인 만큼 친환경성이 높은 것도 장점이다. 때문에 각 지자체와 배달 수요가 있는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인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들은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초소형 전기차는 지자체별로 250만~500만원을 준다. 환경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더하면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자가 부담을 400만~500만원 수준으로 낮춰 초소형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의도다.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도 있다. 전라남도는 초소형 전기차 보급을 골자로 하는 e-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 진입이 금지됐던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원도는 국내 중소기업들과 협력해 횡성 지역을 초소형 전기차 생산기지로 구축하고 나섰다.
기업들도 이륜 오토바이에 의존하던 배달 수요를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달부터 올 연말까지 초소형 전기차 1000대를 도입하고 내년까지 1만대로 늘려 이륜 오토바이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대창모터스 다니고3, 쎄미시스코 DC2, 마스터전기차 마스터밴 등이 선정됐다.
우본은 연간 약 300건에 달하는 집배원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BQ, 미스터피자 등에서도 배달 오토바이 대체를 위해 일찌감치 르노삼성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도입한 바 있다.

짧은 주행거리 탓에 매일 충전해야 하지만 초소형 전기차를 충전할 곳은 마땅치 않다. 초소형 전기차는 급속충전을 지원하지 않기에 가정용 220V 전기로 완속충전을 해야 하는데, 주차장에 콘센트를 둔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아파트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완속충전 콘센트를 두기도 하지만, 다른 차량의 주차로 콘센트가 막히면 사용이 어렵다.
급속충전기에 어댑터를 달아 완속충전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충전기를 독점한다는 눈총을 받기 십상이다. 통상 전기차는 급속충전기로 30분이면 완전충전이 되지만 완속충전을 하는 초소형 전기차는 3시간이 걸리기 때문. 그렇다고 충전을 하루 건너뛰면 짧은 주행거리 탓에 가슴을 졸이게 된다.
높아진 소비자 눈높이를 맞추기엔 편의사양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최근 출시되는 일반 차량들은 사각지대감지, 차선이탈방지, 전방충돌방지 등 다양한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이 기본으로 탑재되지만 아직 초소형 전기차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을 찾아볼 수 없다.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도 법적으로 금지돼 시내 주행 외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이르면 내달부터 국내 100% 생산이 이뤄지는 트위지를 제외하면 국내 유통되는 초소형 전기차 대부분이 중국산 플랫폼에 의존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극소수 업체가 국산 배터리를 쓰고 자체 설계도 하지만 대부분은 국내 중소기업이 중국산 전기차를 수입해 파는 수준에 그친다. AS 등의 문제는 물론, 중국산 전기차에 국고지원을 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륜 오토바이의 대안으로 초소형 전기차가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법적으로 초소형 전기차의 지위가 정립된 것도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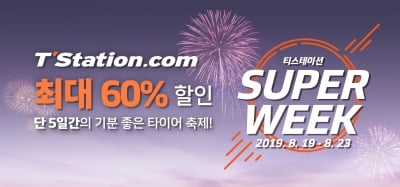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