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前 관세청장 "법인세는 분배보다 효율 중요…확 낮춰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금의 모든 것' 펴낸
김낙회 前 관세청장
조세 요직 섭렵 '30년 조세 공무원'
현장경험 기반 조세정책에 '쓴소리'
김낙회 前 관세청장
조세 요직 섭렵 '30년 조세 공무원'
현장경험 기반 조세정책에 '쓴소리'

국내 조세행정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30년 조세 공무원’ 김낙회 전 관세청장(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사진)이 현행 조세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최근 발간한 저서 《세금의 모든 것》(21세기북스 펴냄)을 통해서다. 김 전 청장은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줄곧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일했다. 기재부 조세정책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과 기재부 세제실장 등 세제분야 요직을 역임한 뒤 2016년 5월 관세청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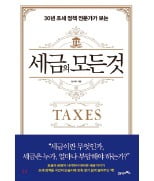
그는 ‘중소기업에는 관대하고 대기업에는 엄격한’ 한국의 기업 조세정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단일세율로 운영하는 미국 등 주요국과 달리 기업 규모가 클수록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세 구조다. 그는 연구개발(R&D) 투자를 세액공제해줄 때 대기업(공제율 0~2%)과 중소기업(25%)을 차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R&D 성과를 확산시키는 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통할 때 훨씬 효과적인데 R&D 지원에 차등을 두는 건 맞지 않다”는 얘기다.
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해 최대 65%(내년부터 60%)에 달하는 상속증여세에 대해 “50%가 넘는 세금 부담을 지우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조세회피를 유발하는 만큼 소득세율(최고 42%)과 같거나 낮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소득세에 대해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 비중은 60~70%에 달하지만 한국은 절반에 불과하다”며 “소득세 세수를 늘리기 위해 최고세율을 올리기보다 공제와 감면을 축소해 과세 베이스를 넓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한 데 대해선 “EITC의 가장 큰 목적은 ‘근로의욕 제고’인데 새 제도는 소득보장과 재분배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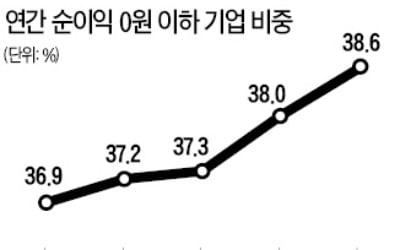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