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은 《택리지(擇里志)》(1751)에서 사대부가 기거할 만한 곳의 필요충분조건으로 풍수, 경제, 인심, 풍광을 꼽았다. 풍수와 경치가 좋으면서 먹고살 만하고 풍속도 좋은 곳이 으뜸이란 얘기다. 그 기준에 부합한 게 전남 법성포, 충남 강경포구 등 포구와 강가의 물류 집산지들이었다.
요즘 살기 좋은 곳의 조건에는 몇 가지 더 추가해야 한다. ‘현대인을 위한 택리지’를 쓴다면 교통, 환경, 교육, 의료, 문화, 편의시설, 일자리 등을 두루 갖춘 곳이 꼽힐 것이다. 그중에서도 일자리가 단연 우선이다.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고 각종 인프라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해 살고, 천혜의 풍광을 지닌 강원도 인구(154만 명)가 정체 상태인 것도 그런 이유다. 은퇴 후에 제주도처럼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잠시 산다면 몰라도, 먹고사는 문제까지 감안해 한 곳에 뿌리 내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미국에서도 살기 좋은 곳의 기준이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시사전문지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가 선정한 ‘최고의 주(best state)’는 워싱턴주다. 지난해 6위에서 1위로 껑충 뛰었다. 이어 뉴햄프셔, 미네소타, 유타, 버몬트, 메릴랜드, 버지니아주 순이다. 선정기준은 헬스케어, 교육, 경제, 인프라, 기회, 재정안정성, 범죄 및 교정, 자연환경 등 8개 분야의 공식통계와 5만 명의 설문 결과다.
워싱턴주에는 최고 기업도시로 부상한 시애틀이 속해 있다. 시애틀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등의 본사가 있는 일자리 천국이면서 치안과 기후도 좋아 ‘살기 좋은 도시’로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이어 2위다. 실리콘밸리를 끼고 있는 샌프란시스코(4위), 포천 500대 기업 중 17개가 있는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3위)와 세인트폴(7위)도 상위에 올랐다. 일자리가 있은 연후에 다른 조건이 구비돼야 살기 좋은 도시인 셈이다.
우리나라도 울산 창원 거제 구미 군산 등 산업도시들이 한때 각광받은 적이 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최상위권인 ‘부자 도시들’이었다. 특히 ‘노동자 천국’이라는 울산은 해외 유명 교향악단들이 와서 공연했을 정도다. 하지만 주력산업 부진에 따른 지역경제 몰락 속에 고(高)실업 도시가 돼가고 있다. 도시의 부침도 결국 기업과 일자리에 달렸다.
ohk@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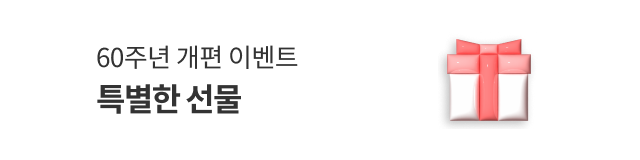
![[천자 칼럼] 황금종려·황금사자·황금곰…](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AA.19740633.3.jpg)
![[천자 칼럼] '중국산 놀이터'](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AA.19726640.3.jpg)
![[천자 칼럼] 프레온가스와 미세먼지](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AA.1971851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