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전시행정' 비판
삼성·LG·SK 등 35개 참가
"대통령 위한 전시회…구색 맞추기"

이날 전시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네이버, 코웨이 등 CES에서 주목 받은 국내기업 35곳이 참가했다. 주제는 ▲AR·VR ▲스포츠엔터 ▲헬스케어 ▲스마트홈·시티 ▲로봇 등 5개로 구성됐다.
화면을 돌돌 말았다 펴는 LG 롤러블 TV와 크기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삼성 마이크로 LED TV, 인공지능 홈 로봇 등이 전시회 메인으로 자리잡았다. 3D 초음파 태아 얼굴 촬영 VR, 휴대용 뇌영상 촬영장치,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제품 등 중소기업의 혁신제품도 나왔다. CES에서 소개된 제품이 그대로 전시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니 홍보 효과는 있었다. 혁신 기술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시장을 찾은 일반 관람객도 눈에 띄었다. 다만 전시회가 주말이 아닌 평일(화~목, 10시~18시) 오후에 열리는 만큼 숫자는 많지 않았다.
예정에 없던 비용을 쓴 기업을 중심으로 흥행참패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판 CES인 '한국전자전(KES)'이 매년 열리는 만큼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참가기업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어떻게든 진행된 만큼 최대한 많은 관람객들이 왔으면 좋겠다"면서도 "내년에 또 하자고 할까봐 걱정된다. 10월 열리는 한국전자전에 집중하거나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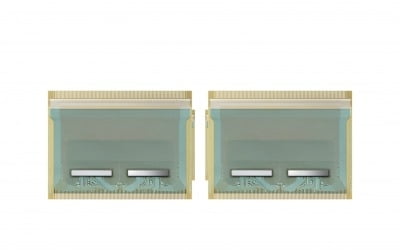

![[촌철살IT] 8천만원 '롤러블 TV', 굳이 돌돌 말려야 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1901/01.1880104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