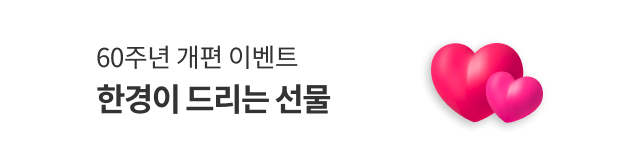재계 일부 '직고용 파장' 우려
"운전직까지 고용보장은 경영부담"

삼성이 400여 명에 달하는 파견직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으로 바꾼 이유 중 하나는 ‘업무 연속성’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보다 2년이란 ‘데드라인’을 없앤 데 따른 고위 임원들의 업무효율 향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4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8000여 명을 직접 채용한 결정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운전기사들도 애프터서비스(AS) 기사와 마찬가지로 파견업체 소속이지만, 사실상 삼성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삼성이 솔선수범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번 결정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올인’하는 정부 정책에 재계 1위 기업이 맞장구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얘기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선 삼성의 최근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운전직까지 직접 고용할 정도로 몸을 ‘무겁게’ 만들면 향후 경영환경이 나빠질 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계 관계자는 “라이벌인 애플은 스마트폰 제조도 핵심 역량이 아니란 이유로 외부에 맡기는데 삼성은 오랜 기간 외주를 줬던 AS와 운전까지 다시 내부로 끌어안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핵심역량을 내재화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최근 트렌드와는 사뭇 다르다”고 덧붙였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