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정상 '65년 만의 終戰' 논의 착수… 완전한 비핵화가 관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급물살 타는 평화협정
靑 "당사자인 남북 합의 우선…美·中과 4자 선언도 가능"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 변수…'형식적 선언'에 그칠 수도

하지만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때처럼 “종전 선언에 협력한다”는 단순 합의로 끝나거나 북한이나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핵 폐기 일정을 못 박지 않는 한 북한 의도대로 핵 있는 평화 상태의 ‘무늬만 종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靑 “남북 간 종전 합의 노력”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 종전 협상과 관련해선 꼭 종전이란 표현이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합의는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직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북·미 간 정전협상과 달리 최우선 당사자인 한국이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종전 선언 주체에 대해 “당사자인 남북 간 합의가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우선 남북 간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다. 누가 이를 부인하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지난 (3월) 특사단 방북 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은 남한에 군사적 조치를 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남북 간 합의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며 “3자 간, 더 필요하면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평화 체제의 실효적 전환을 위해선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합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과 북한, 중국이다.
아직 갈길 먼 終戰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확립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과도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선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이 남북 간 화두로 처음 제시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2005년 북핵 6자회담 이후 있었던 9·19 공동성명(2005년)에서 처음 논의됐다.
평화 체제 논의의 ‘입구’ 차원에서 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6·25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자는 구상은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인 10·4 선언에 들어갔다. “3자 또는 4자 정상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였다. 하지만 한국의 정권 교체와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이행되지 못했다. 남·북·미 3자 정상회의 구상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11년 전의 3자 또는 4자 종전 선언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되거나 비슷한 문구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10·4 선언 때 북한이 언제까지 핵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결국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북한과 미국이 핵 폐기 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한 남북 간 종전은 그야말로 정치적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종전이 되려면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많다. 북한이 종전 대가로 체제 보장을 받기 위해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북·미 수교를 원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으로 대북 제재 해제와 함께 더 나아가 국제적 지원을 바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나 폐지에 이어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해체를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선 10·4 합의 수준의 정치적 합의를 할 공산이 크다”며 “결국 북·미 간에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비핵화 합의에 이르느냐가 실질적인 종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인설/손성태 기자 surisuri@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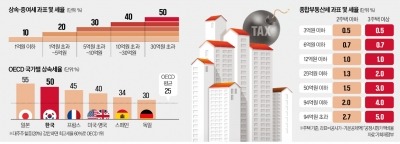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베네치아 비엔날레 섹션 인상 깊어](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051711.3.jpg)